'데이터센터' 전기 사용량 분쟁에…빅테크, 전력회사에 중재안 제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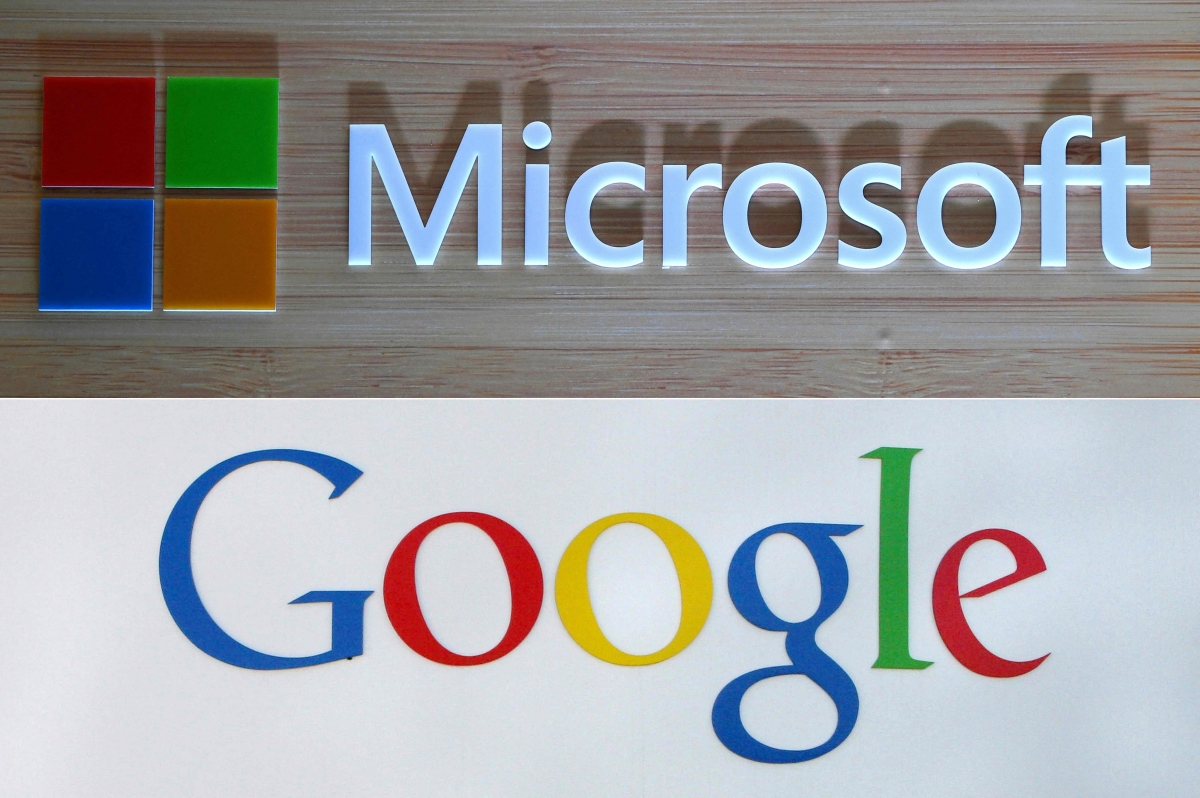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은 오하이오 지역 전력회사인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AEP) 오하이오'가 제안한 요금 인상안에 5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을 포함하는 자체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 계약자는 전력망 확충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합의안은 오는 10월 30일 열리는 오하이오 공공설비위원회 청문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최근 테크 기업들은 오하이오 중부에 데이터센터를 앞다투어 세우며 AEP오하이오와 지난 5월부터 갈등을 빚었다. AEP가 테크기업이 현재 매달 예상 전력 비용의 60%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10년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다. AEP는 AI 업황에 따라 투자가 줄거나 데이터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전력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내야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EP오하이오에 따르면, 이 지역에 설치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은 2020년 100㎿에서 2024년 600㎿로 늘고, 2030년에는 5000㎿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AEP 오하이오는 7~10년간 새 송전선을 설치해야 한다. 당시 기업들은 불합리한 요구라며 반발했지만, 이번 중재안을 제시하며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활로를 연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드컴퍼니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2030년이 되기 전에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론 덴먼 베인앤드컴퍼니 미주 유틸리티 및 재생 에너지 부문 책임자는 "이것은 실제로 다가오는 문제"라며 "이 부족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요금 인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빅테크 참전에 원전 부흥?…"소는 누가 키우나"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A.38062992.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