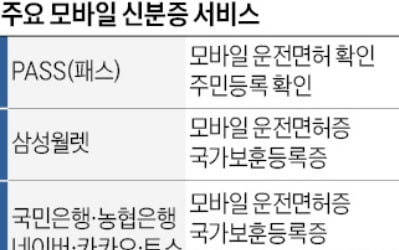[단독] 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양광 인증 가격 폭등
文 '탈탄소 과속'에 시장 망가져
국가 REC 보유량 턱없이 부족
가격 올라도 시장에 풀 물량 없어
文 '탈탄소 과속'에 시장 망가져
국가 REC 보유량 턱없이 부족
가격 올라도 시장에 풀 물량 없어
![[단독] 통제불능 된 신재생인증제도…혈세 18兆 풀어 사업자만 배불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42429.1.jpg)
○‘실탄’ 없어 가격 통제 포기
1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2월부터 국가REC 매도를 중단했다. RPS 제도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REC 평균 가격이 직전 60개월 현물 평균가보다 30% 넘게 오르면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보유 REC 물량을 풀 수 있다. 이 기간 REC는 7만4000~7만9000원대에 거래돼 매도 가능 기준가(7만~7만1000원)를 넘었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공단이 가격 조절을 포기한 것은 내다 팔 국가 REC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후 민간 태양광 발전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국가 REC는 정부가 출자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지분만큼 쌓이는 구조여서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전체 시장에서 국가 REC 비중은 58.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6%에 그쳤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REC를 대규모로 매도했지만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이는 REC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안정시킬 국가 REC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장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선 가격 추가 상승을 예상해 사재기 수요까지 생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쓸 ‘실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올해 말 발전사들이 연간 RPS 이행 비율을 채우기 위해 매수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7년간 18조 쓴 한전…결국 전기료로
왜곡된 RPS 제도가 혈세를 낭비하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를 배불리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대량의 REC를 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18조의 11)에 따라 한전이 산하 발전사 5곳의 REC 구매 비용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든 비용은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발전사들이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갚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RPS와 관련해 한전이 지출한 금액은 3조3950억원, 7년간 쓴 비용은 약 18조36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채가 202조4500억원에 이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셈이다. 올해 13.5%인 의무 공급 비율이 2030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혈세 투입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500㎿ 규모 이상의 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들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채울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단독] '신재생 인증' 가격 폭등…정부도 손놨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34108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