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兆' 램시마…가성비·속도전 앞세워 바이오시밀러 평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셀트리온 램시마, K바이오 120년 만의 쾌거
바이오 불모지 뛰어든 서정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오리지널보다 가격 30% 저렴
유럽 60% 브라질 40% 점유율
셀트리온, 번 돈으로 R&D 투자
머크·화이자서 가능한 선순환 확보
내년 바이오시밀러 5종 승인 대기
제약사들, 제네릭 대신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창업도 크게 늘어
바이오 불모지 뛰어든 서정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오리지널보다 가격 30% 저렴
유럽 60% 브라질 40% 점유율
셀트리온, 번 돈으로 R&D 투자
머크·화이자서 가능한 선순환 확보
내년 바이오시밀러 5종 승인 대기
제약사들, 제네릭 대신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창업도 크게 늘어

출시 12년 만에 매출 1兆 달성

셀트리온은 2006년 사업 방향을 과감히 틀어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정맥주사 제형) 개발에 뛰어들었다. 당시만 해도 바이오시밀러가 없던 때여서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겠느냐’ ‘경험도 없는 회사가 글로벌 임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다. 하지만 2012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유럽의약품청(EMA),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차례로 받아내며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에 단백질 기반 바이오시밀러의 탄생을 알렸다.
K-바이오 가능성 증명한 램시마
램시마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개화에도 기여하며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의약품이다. 1세대(2000년대) 바이오시밀러는 단순 인슐린이나 백신 복제약에 가까웠다. 하지만 레미케이드, 휴미라와 같은 항체의약품은 더 정교한 단백질 분석 및 제조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1세대 의약품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은 이런 고가의 항체의약품을 효능은 동등하면서도 가격은 20~30%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유럽과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냈다.한 병당 170만원 남짓하던 치료제를 30%가량 저렴하게 내놓자 전 세계 의사와 환자들이 찾기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화이자, 산도즈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지형도 바꿔놨다. 제네릭에만 의존하던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고 바이오벤처 창업도 크게 늘었다.
국내에 신약 개발 열풍 불 붙여
램시마 주 고객이 제약·바이오 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 유럽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바이오 선진국에서 국산 약이 선전한다는 점 자체가 국내에 신약 개발 열풍을 일으킨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꼽히는 국산 신약도 모두 램시마 성공 이후 나온 의약품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단일 품목으로 매출 1조원을 넘겼다는 것은 셀트리온 회사뿐 아니라 한국 바이오산업에도 큰 이정표”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기준 램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60%대, 미국은 30%대다.글로벌 대형 제약사(빅파마)와 비슷한 사업구조 모델을 갖추게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블록버스터에서 벌어들인 매출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허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미국 MSD, 화이자, 일본 다이이찌산쿄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사업 구조다. 실제로 램시마로 구축한 선순환 모델을 기반으로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사로 변신 중이다. 5종의 바이오시밀러도 추가로 승인받을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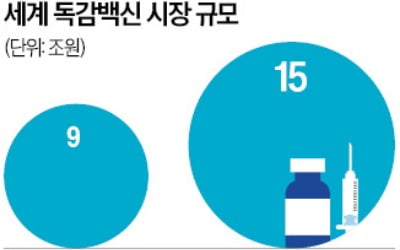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