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불가마에서 묶은 때같은 나쁜 기억 씻고 가세요” [서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꿈의 불가마
정소정 지음/나무옆의자
226쪽|1만5800원
정소정 지음/나무옆의자
226쪽|1만5800원

장편소설 <꿈의 불가마> 속 주인공 주연은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스물아홉살 취준생이다. 가장 월세가 싼 원룸으로 이사했으나, 설상가상으로 집 수도관마저 터져버린다. 그러다 전 주인이 남기고 간 목욕권 한 장을 우연히 발견하고, 약도를 따라 여성 전용 불가마 ‘미선관’에 도착한다.
정소정 작가의 소설 데뷔작인 이 작품은 ‘2022 한경 신춘문예’ 스토리 부문 1등 당선작이다. 정 작가는 직장을 다니던 중 연극 ‘지하철 1호선’ 4000회 기념 공연에 감동받아 퇴사하고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모래섬’, ‘뿔’, ‘가을비’ 등의 연극 대본을 썼다. 드라마 대본으로 쓴 ‘미쓰 불가마’가 한경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이를 소설로 바꾼 것이 <꿈의 불가마>다.
![“꿈의 불가마에서 묶은 때같은 나쁜 기억 씻고 가세요”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29388.1.jpg)
소설에 이런 따뜻함과 소통이 담겨 있다. 미선관엔 서로의 나이도 직업도, 이름도 묻지 않는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 뒤에 ‘언니’를 붙일 뿐이다. 미선관의 터줏대감인 ‘대장 언니’, 플라스틱 얼음 컵을 들고 다니며 늘 얼음을 입에 물고 있는 ‘얼음 언니’를 비롯해 ‘카운터 언니’, ‘액세서리 언니’, ‘강남 언니’ 등이 있다. 친근한 호칭 때문인지, 서로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며 함께 땀을 흘리기 때문인지, 불가마 안 여자들은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며 서로 마음을 나눈다.
정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진흙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단단하고 빛이 나는 도자기가 되듯, 그렇게 사람도 가마 속에서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무언가로 변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소설 속 인물들과 함께 울고 웃다 보면 어느새 읽는 이의 근심도 가마에서 흘리는 땀처럼 씻겨 나가게 하는 작품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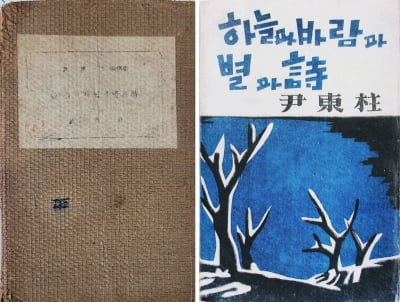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