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고고씽'과 계약
자전거·킥보드 빌려타다 사고나면
치료비 최대 200만원 한도 보장
고고씽은 지난해부터 여러 보험사를 찾아다녔지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계약을 거절당해 애를 먹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DB 쪽에서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여 퍼스널 모빌리티(개인용 소형 이동수단) 업계 최초로 전용 보험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DB 측은 시범 운영 차원에서 재보험을 끼고 500대 규모로 계약했다. 분석을 거쳐 해마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1~2년 전만 해도 승차공유 관련 상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고 위험이 높고 통계 자료가 부실해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중)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올 들어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승차공유업계와 접점을 늘리고 빅데이터 확보에 나서면서 ‘공유경제 시대’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악사손해보험은 올 상반기 국내 최초 카셰어링 보험을 내놓는다. 국내 최대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손잡고 공유차에 최적화한 운전자보험, 법인고객 전용보험, 탁송기사보험 등을 개발하고 있다. 쏘카는 렌터카공제조합에 맡겼던 전국 1만여 대 렌터카의 자동차보험도 전부 악사로 넘겼다. 악사로선 대규모 B2B(기업 간 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카셰어링산업의 운영 방식을 속속들이 파악할 기회까지 얻게 된 셈이다.
카셰어링은 20~30대가 많이 쓰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개인 소유 차량보다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보험업계에선 쏘카 물량을 가져간 악사가 ‘적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악사 측은 “프랑스 본사에서 우버, 블라블라카 등과 승차공유 보험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대해상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대시’와 제휴해 운행 기록과 사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2017년 업계 최초로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을 출시했지만 판매에 공격적으로 나서진 않았다. 손해율 관리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재원 현대해상 상무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계기로 공유킥보드에 맞는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새 먹거리 될 수 있을까
국내에 보급된 퍼스널 모빌리티는 2016년 6만 대에서 연평균 12.2%씩 늘어 2022년 20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라임’과 ‘버드’, 중국의 ‘오포’와 ‘모바이크’ 등을 본뜬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줄줄이 창업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어 보험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김동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이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손해율 관리도 쉽지 않아 손해보험사들이 진입을 꺼려 왔다”면서도 “전망이 밝은 만큼 금융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2022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추이나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을 봐 가며 차근차근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만 달릴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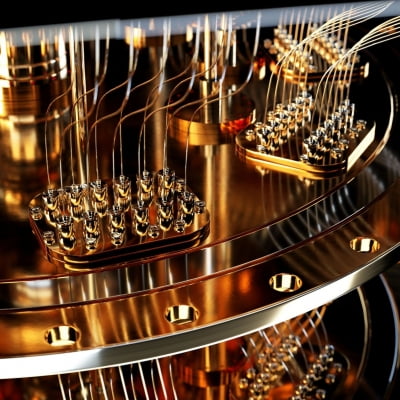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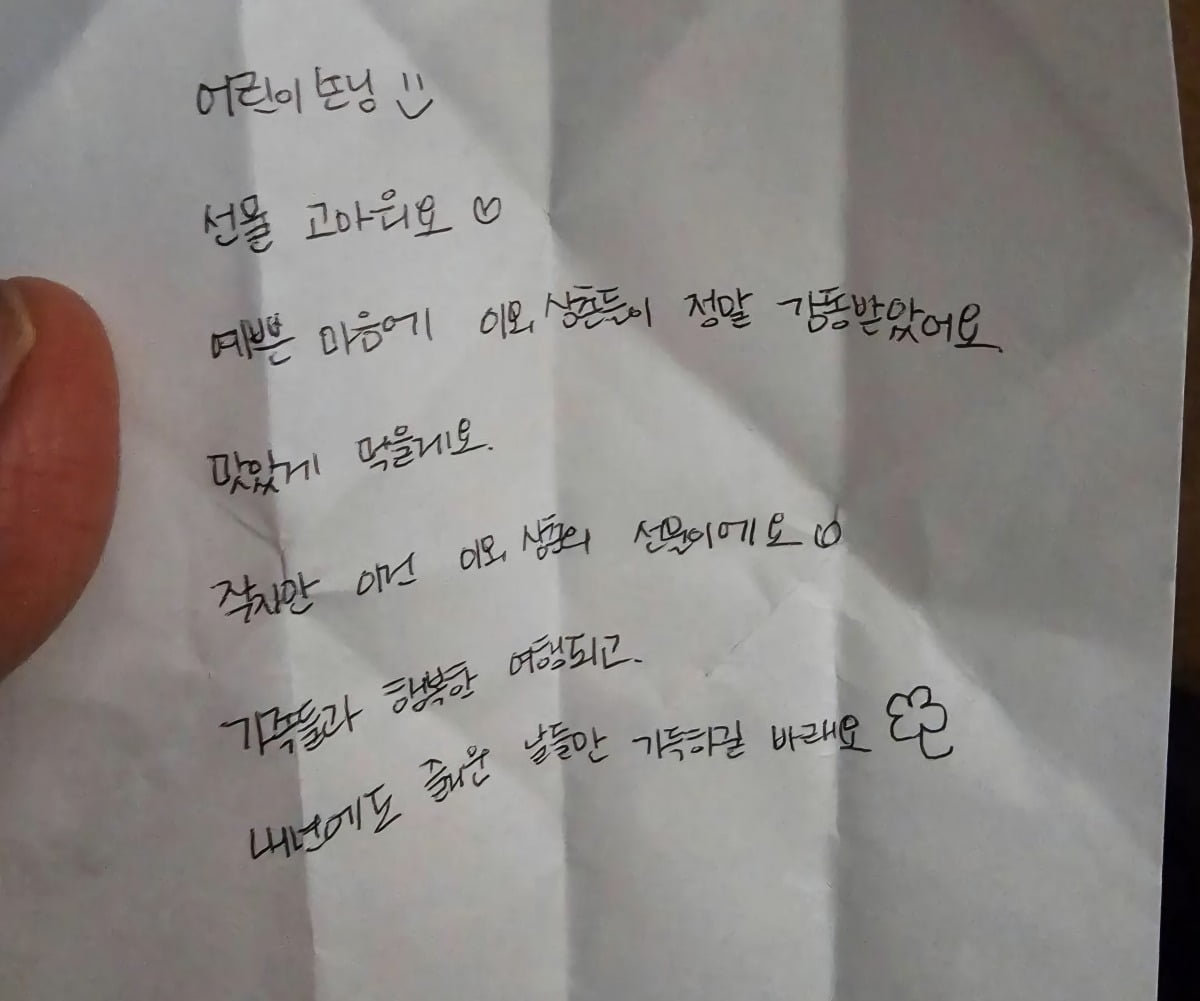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764375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