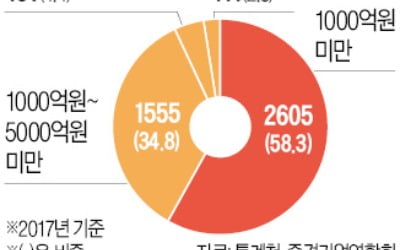1997년 창업 이후 승승장구
'기술력+가격 경쟁력' 잡아

연구개발(R&D)과 제조부문 간 근거리 상호협력체제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 됐다.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보안시장에서 공세를 펼칠 때도 고품질 시장에서 아이디스의 입지는 굳건했다.
아이디스는 올해부터 해외와 국내 생산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생산 방식을 바꾼다. 고품질 제품(하이엔드) 시장뿐 아니라 저가 제품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에 16만5300㎡ 규모의 공장 부지를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나선다. 김영달 아이디스홀딩스 대표는 “국내 공장의 기술력에 베트남 공장의 가격 경쟁력을 결합하기 위해 해외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며 “해외 생산기지 구축으로 2022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디스그룹은 올해 ‘1조클럽’ 목표를 향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짓고 가동에 나섰다. 지난해 하노이에 16만5300㎡ 규모 부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6만6000㎡에는 지난해 말 계열사인 코텍의 산업용 모니터 생산공장을 완공했다. 나머지 부지에도 다른 계열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순차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국내 생산을 고집하던 아이디스가 베트남에도 생산기반을 마련한 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과 경쟁하려면 해외 생산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인건비에 밀려 국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존 제조기업과 다른 사례다. ‘이전’이 아니라 ‘확장’이 목표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국내 공장은 고가 제품의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다”며 “베트남 공장을 설립해도 국내 생산공장 규모와 물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시장 상황도 아이디스에 우호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중국 보안업체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대안으로 한국 기업이 떠오르고 있어서다.
김 대표는 “중국 기업들이 ‘백도어’(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프로그램)를 활용해 CCTV로 얻은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안전성이 중요한 보안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한국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과 동시에 강소기업 ‘주목’
아이디스는 1997년 창업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첫 아이템인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는 세상에 없던 제품이었다. DVR은 CCTV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저장하는 장치다. CCTV 영상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녹화 시간이 길고 테이프를 갈아 끼우지 않아도 돼 간편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 제품을 납품하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벤처기업으로선 드물게 세계 시장 1위를 석권했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는 빨랐다. 고해상도 CCTV가 필요해지면서 저장장치뿐 아니라 카메라도 디지털로 전환했다. 디지털카메라와 저장장치를 함께 생산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아이디스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납품하던 기업들이 하나둘 시장에서 밀려났다.
김 대표는 “제품 생산만 할 게 아니라 브랜드를 키우고 소프트웨어까지 결합한 통합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통합솔루션 기업으로 변신 성공
2012년 ‘아이디스’라는 자체 브랜드명으로 CCTV 시장에 진출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박람회 부스에서 가장 큰 자리를 확보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신생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는 조롱이 쏟아졌다. 오랜 기간 보안업계에서 업력을 쌓아왔지만 새로운 브랜드 인지도를 얻는 일은 그만큼 쉽지 않았다.
자체 브랜드를 키워온 노력은 2년여 전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다. 2018년 매출에서 자체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고품질 제품 시장에서 아이디스의 기술력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김 대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자체 브랜드와 제조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은 손에 꼽을 만큼 적어 자부심이 남다르다”며 “지난해를 변곡점으로 실적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