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컬리러버스 장바구니가 스승…대기업의 추격? 두렵기보다 고맙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출발 2020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의 꿈과 도전
"뭘 팔까"보다 "뭘 안팔까" 고민
충성고객과 공급사 만들기 성공
2~3년 내 흑자전환 전망
매주 금요일마다 '상품위원회'
300~400개 제품 맛보고 평가
연말마다 사업계획서 보며
"옳은 일로 세상 변화시키자" 다짐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의 꿈과 도전
"뭘 팔까"보다 "뭘 안팔까" 고민
충성고객과 공급사 만들기 성공
2~3년 내 흑자전환 전망
매주 금요일마다 '상품위원회'
300~400개 제품 맛보고 평가
연말마다 사업계획서 보며
"옳은 일로 세상 변화시키자" 다짐

그가 창업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들여다보는 게 있다. 마켓컬리 회원들의 장바구니다. 김 대표는 “장바구니와 후기가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했다. 누가 무엇을 샀는지 분석하고, 내일은 무엇을 팔지 설계한 지 5년차. 올해는 ‘두려움이 사라진 해’라고 했다.
창업 5년…도시의 새벽을 바꿨다

새벽배송 시장은 지난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롯데, 신세계 등 유통 강자들이 모두 뛰어들었다. 신생 업체도 생겼다.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5년 만에 100억원에서 8000억원대로 80배 커졌다. 첫해 29억원이던 마켓컬리 매출은 지난해 4000억원대로 늘었다. 2018년보다 3배, 2017년보다는 10배 성장했다.
마켓컬리는 강력한 ‘큐레이션’으로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살 것이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에 마켓컬리는 더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골라 추천한다. 총 1만 개의 품목을 판매하는 마켓컬리는 지난해 신제품을 3000개 넘게 쏟아냈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고민도 커졌다. 요즘은 ‘무엇을 팔까’보다 ‘무엇을 안 팔까’를 정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쓴다. 김 대표가 매주 금요일 상품기획자(MD)들을 모아 주관하는 상품위원회엔 1차 선정을 거친 300~400개 제품이 올라온다. 70가지 기준으로 모두 맛을 보고 평가한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회의는 매번 밤 10시를 넘어 끝난다.
우린 ‘농부형 인간’…더 강해진 체력

김 대표는 “회원 300만 명은 자신의 장바구니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후기를 남기면서 제2, 제3의 MD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후기를 남기는 비율이 50%에 달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제품 연 3000개…단독상품만 30% 넘어
마켓컬리는 다른 신선식품 유통사와 달리 공급사의 제품을 100% 직매입한다. 도매상을 거치며 떠안는 생산자의 재고 부담을 줄이고, 대금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다. 경쟁사로 빠져나갔던 공급사 중엔 ‘유턴’한 곳도 적지 않다. 우수 공급사가 늘면서 마켓컬리 단독 상품은 30%를 넘었다. 5년간 공급사들도 급성장했다. ‘푸드렐라’ ‘태우한우’ 등 마켓컬리가 발굴하고 공동 기획한 브랜드들은 이제 ‘브랜드관’을 열 만큼 성장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가격으로만 경쟁하던 휴지 제조사들은 마켓컬리의 기획을 통해 ‘먼지가 안 나는 휴지’ ‘부드러움의 정도가 1~5까지 나뉜 휴지’ ‘고창 황토 성분 휴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마켓컬리가 ‘까다롭게 골라 파는 플랫폼’으로 성장하자 “상품을 팔아달라”고 찾아오는 기업들도 달라졌다. 지난해 말 뱅앤올룹슨코리아의 고가 스피커와 헤드셋 등 제품이 완판되면서 다른 명품 가전 및 가구 회사들도 몰려오고 있다. 대부분은 “안 팔려도 좋으니 마켓컬리에 우리 제품 사진이라도 걸어보자”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인덕션 제품 중 화이트 컬러를 마켓컬리에만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제 300만원짜리 스피커도, 수십만원짜리 베개도 팔린다. 뭘 팔아도 팔리니, 책임감은 더 커졌다.
언제 흑자로 돌아설까
회사가 커지면서 조직도 달라지고 있다. 새로 생긴 ‘CEO오피스팀’이 눈길을 끈다. 일종의 ‘응급처치반’이다. 김 대표가 5년간 해왔던 일들을 언제든 나눠서 처리한다. 10여 명의 핵심 멤버로 구성됐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마켓컬리는 지난 5년간 새로운 시장을 키우기 위해 물류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1000억원 안팎의 누적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그동안 2300여억원을 투자 받았다.
‘언제 흑자로 돌아설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표는 “당장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비용은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일’에 쓰였다는 것. 브랜드를 충분히 알렸고, 충성 고객의 ‘습관 만들기’에도 성공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은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다. 업계는 마켓컬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2~3년 내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매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대표는 “더 크고 멋지게 회사를 키우고 싶은 건 모든 창업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마켓컬리도 언젠가 변곡점이 오겠지만 어떻게 성장하는지와 회사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자신을 ‘사과 농부’에 비유한다. 그래서 직원들도 ‘농부형 인간’을 더 많이 채용한다고 했다. 과수원업은 최소 20년은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직원들에게 전한 신년 인사말에서 ‘옳은 일’을 여러 번 강조했다. “스스로를 잠깐 속이고 쉬운 길로 갈 수 있지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잘못한 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마켓컬리의 DNA입니다. ‘옳은 일’이란 첫날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겠지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어떻게 지키며 키워갈지에 대한 김 대표의 고민이 묻어났다. ■ 김슬아 대표는…
'좋은 먹거리'에 미친 경영자…새벽배송 개척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신선식품 새벽배송’에 도전해 유통업계의 판을 흔들고 소비자의 삶을 바꾼 창업자다. 미국 웰즐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골드만삭스와 맥킨지, 베인앤드컴퍼니 등 글로벌 기업에서 일했다. 직접 장바구니를 담고 요리하는 까다로운 소비자였던 그는 “누구나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즐기고 싶어 한다”는 생각으로 2015년 5월 마켓컬리를 창업했다.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투자해 4년 만에 회원 수 300만 명, 월 매출 300억원의 국내 1위 새벽배송 회사를 키워냈다.
△1983년 부산 출생
△2007년 미국 웰즐리대 정치학과 졸업
△2007년 골드만삭스 홍콩지사
△2010년 맥킨지앤드컴퍼니 홍콩지사
△2013년 베인앤드컴퍼니 한국지사
△2015년 (주)컬리(옛 더파머스) 설립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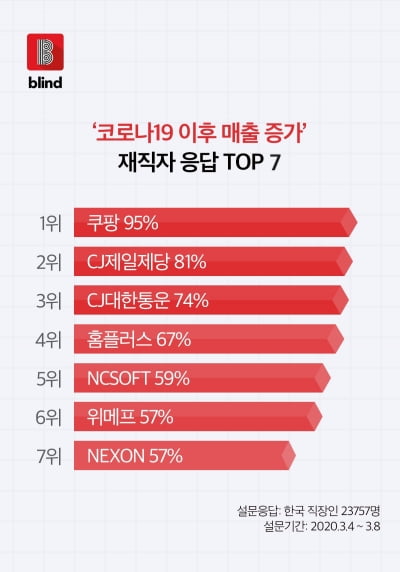

![[리뷰+] "운 좋으시네"…5부제 마스크는 '입고시간' 로또?](https://img.hankyung.com/photo/202003/01.2199796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