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중교통 대체수단 인기
현대차·SK 등 잠재력 보고 투자
킥보드 수거·충전 부업도 등장
이용 늘자 거치구역 규제법 발의
지자체 진출 조항도…업계 반발

공유 킥보드가 도심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얼리 어답터’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대학생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사용자 폭이 넓어졌다. 업체들이 앞다퉈 킥보드 수를 늘리면서 서울이 공유 킥보드의 ‘격전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개월 만에 5배로 ‘쑥’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는 8월 말 기준 3만5850대다. 지난 5월에는 1만6580대였다. 3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작년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말 서울시에 등록된 킥보드 수는 7500여 대였다. 8개월 만에 시장 규모가 5배로 커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사람이 늘면서 대체 이동수단을 찾아 공유 킥보드로 눈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올해 말부터 이용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 등’의 항목으로 분류돼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이용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라임, 킥고잉, 씽씽 등 주요 킥보드업체들은 운영 대수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유 킥보드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직업군도 생겼다. 라임·버드·더스윙 등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길거리 곳곳에 있는 방전된 킥보드를 수거한 뒤 충전해서 갖다놓으면 건당 4000원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반인들이 원하는 때 일할 수 있어 부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임이 운영하는 충전·수거 인력 ‘쥬서(juicer)’ 수는 서울에만 1000명에 육박한다.
대기업들도 킥보드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GS칼텍스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를 전동킥보드 대여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라임과 손잡았다. 자사 주유소를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자동차와 SK는 공유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각 킥고잉, 씽씽에 투자했다.
“거치구역 제한은 활성화 아니라 규제”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이용자가 급증한 만큼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보행자와의 충돌, 공유 킥보드 방치에 관한 민원이 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처럼 공유 킥보드 거치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 킥보드 업체를 세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있는 킥보드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유 킥보드의 장점인데 거치구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산업인 만큼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공유 킥보드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자는 것은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일 뿐”이라며 “신산업을 애물단지로만 바라본다면 누가 새로운 시장을 열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이선아/최한종 기자 suna@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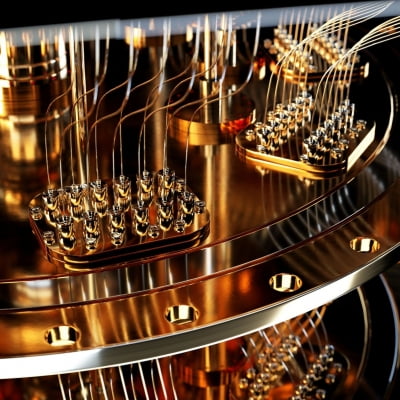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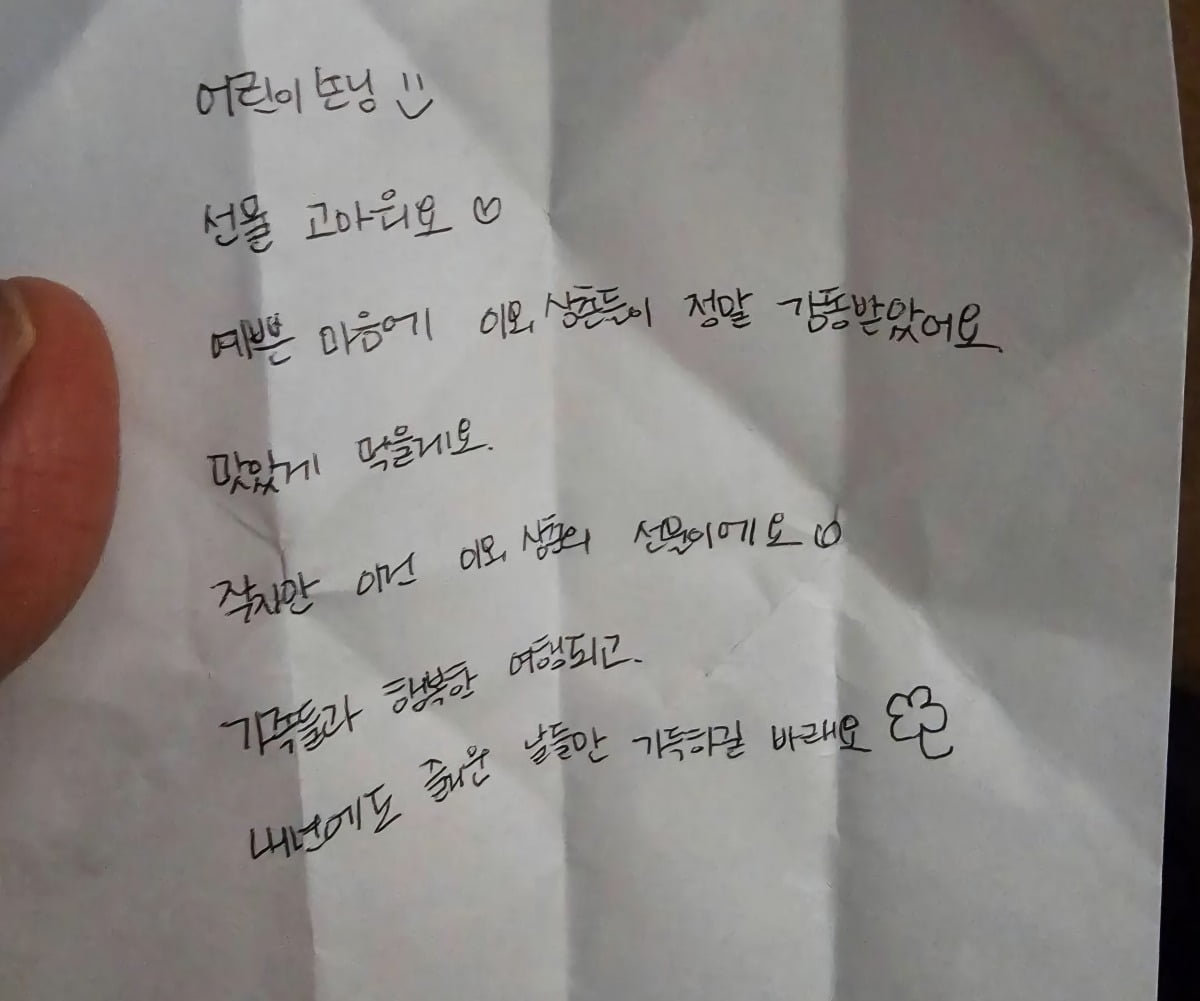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764375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