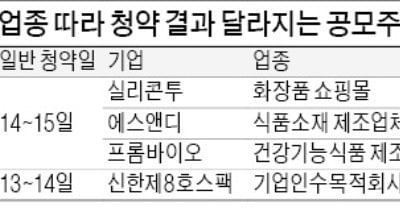"PSR이 뭐길래…"'몸값 2조' 케이카, 공모가 좌우한다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가매출비율(PSR) 방식 통해 공모가 산정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 2조773억원
구주매출 비중 높아…오버행 우려는 낮아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 2조773억원
구주매출 비중 높아…오버행 우려는 낮아

케이카가 공모가 산정에 전적으로 '주가매출비율'(PSR) 만을 활용했다. 통상 상장 예정기업과 유사한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을 따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모주에 참여하기 전에 주가를 따지는 기준이 다른만큼 이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카는 오는 27~28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하고 같은 달 30일과 10월1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받는다. 희망공모가는 3만4300~4만3200원, 공모 규모는 5773억~7271억원이다. 시가총액은 1조6494억~2조773억원으로 예상된다.
케이카는 공모가 산정에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을 사용했다. PER이 아닌 PSR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PSR은 쉽게 말해 해당기업의 기업가치가 매출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 지표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미국 최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인 카바나(Carvana) 등 해외 중고차업체들과의 PSR 지표를 통해 기업가치를 통해 산정했다.
PER이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통해 기업가치를 따진다면, 케이카는 오직 '매출'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가늠하는 것이다. 케이카 매출액은 2018년 7428억원에서 지난해 1조3231억원으로 연평균 35.6%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은 1557억원에서 4082억원으로 연평균 63.1% 늘었다. 판매 대수는 지난해 11만대에서 올해 13만대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카는 이번 공모가 산정에 △카바나(Carvana) △카맥스(Carmax) △브이룸(Vroom) 등 미국 소재 6개 회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내 중고차 전문업체 중 상장기업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케이카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엔 아직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 상장한 사례가 없어, 해외 중고차매매 상장사들을 기준으로 공모가 비교(피어)그룹을 산정했다"면서 "현재 해외에 상장된 중고차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적자인 상황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했던 방식인 PSR 방식으로 피어그룹을 선정해 공모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가총액을 산정해보면 약 2조원에 달하는 대형종목인만큼 이러한 기준을 굳이 따지지 않고 공모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업의 부실척도를 이익을 따지는 국내 주식에서 오직 '매출만 기준'으로 삼는 주가산정 방식이 투자자들에 통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케이카의 상장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구주매출의 비중이 더 많다는 점이다. 구주매출은 기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케이카의 최대주주는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앤컴퍼니이다.
한앤컴퍼니는 공모 주식 수의 90% 이상인 1562만8124주를 구주 매출로 내놨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특수목적법인(SPC)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를 통해 2018년 초 SK㈜로부터 SK엔카 직영사업부(중고차 오프라인 사업부)였던 케이카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후 재무적투자자(FI) 도움 없이 케이카를 키워냈다.
그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구주매출은 부정적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공모 자금이 회사에 쓰이는 것이 아닌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앤컴퍼니는 케이카 공모를 마친 이후엔 지분율이 65%로 줄어든다.
다만 FI가 없어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잠재적 매도물량(오버행) 우려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FI는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보호예수를 걸지 않을 경우 상장 직후 오버행을 초래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앰컴퍼니는 우선 보호예수 기간을 의무기간(6개월)보다 반년 더 긴 1년으로 설정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뜨거운 2차전지주 인기…원준 공모주에 기관들 63兆 주문[마켓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5357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