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자의 오거스타 도전기 ②…우즈도 떤 '유리알 그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희찬 기자의 오거스타 도전기
(2) 유리알 그린, 양탄자 페어웨이
'퍼팅 뒤땅'에 좌절했지만…
공은 10m 굴러 홀 30cm 옆에 붙었다
(2) 유리알 그린, 양탄자 페어웨이
'퍼팅 뒤땅'에 좌절했지만…
공은 10m 굴러 홀 30cm 옆에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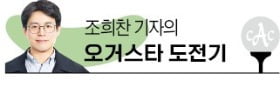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몸을 더 틀었던 것 같다. 스윙 리듬도 평소보다 빨랐고. 아니나 다를까. 깎여맞은 공이 벙커 방향으로 휘더니 나무 숲 사이로 사라졌다. 벙커에 안 들어간 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공을 못 찾으면 ‘O.B’(Out of Bounds)니 실망해야하는 건지 가늠이 안됐다.
야심찬 첫 샷, 솔잎 위 러프로먼저 숲 속으로 공을 보낸 2번 타자 윌 그레이브스 AP통신 기자와 함께 공을 찾으러 갔다. 페어웨이로 들어서자 잔디가 푹신해 마치 양탄자위를 걷는 느낌이 들었다. ‘오거스타 루키’의 첫 티샷은 미스샷이었지만, 단숨에 공을 찾아준 베테랑 캐디 월터 덕분에 세컨샷을 칠 수 있었다. 두번째 샷의 무대는 페어웨이가 아닌 솔 잎 위.
미끄러워 다리 고정 안돼
‘슬쩍 빼놓고 칠까’ 생각했지만
캐디 월터 “점수 신경쓰지 말라”

양탄자 페어웨이와 솔잎 러프
20~30m 높이의 아름드리 나무들은 오거스타GC를 바깥 세상과 떼어놓는 담장 역할을 한다. 이들 나무는 골프장 안에선 홀과 홀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된다. 200야드 정도 나가 우측으로 꺾인 기자의 티샷은 이런 경계선 자리에 떨어졌다.1번 홀(파4·365야드, 333m)과 프레스빌딩 사이에 있는 ‘B러프’(세컨드 컷 러프). 길게 자란 풀으로 만든 ‘A러프’(퍼스트 컷 러프)를 지나 누런 솔잎 사이로 흰색 타이틀리스트 공이 보였다. 오거스타GC는 ‘골퍼들의 혼을 쏙 빼놓을 최상의 B러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컨테이너 10대 분량의 솔잎을 구입해 깐다고 한다.
수백번 라운드를 나간 11년 구력의 골퍼지만, ‘솔잎 샷’은 처음이었다. 미끄러운 솔잎 탓에 빈 스윙을 할 때마다 몸이 흔들렸다. ‘다리를 고정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솔잎이 만든 빈 공간 위에 떠 있는 공을 정확히 맞출 확률은 몇 %나 될까. 임성재 선수가 얘기한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페널티가 있다는 게 이런거구나”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

나쁜 짓을 하려다가 선생님에게 들킨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그래, 못 친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닌데 스코어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나. PGA 룰대로 쳐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짧게 잡은 7번 아이언으로 간결하게 끊어쳤다. 낮은 각도로 130야드 정도 날아간 공은 벙커를 넘어 페어웨이 한 가운데 떨어졌다. 벙커에서 헤매는 마틴 립튼 더선 기자를 뒤로 한 채 세번째 샷 지점으로 향했다. 페어웨이 잔디는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했고,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랬다. 국내 대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최고라는 골프장들을 수없이 거닐었지만, 이 정도로 촘촘하게 잔디를 심은 곳은 기억나지 않는다. 마스터스 대회 4라운드가 끝난 직후인데도 디봇 자국 하나 없었다. 디봇이 생기면 당일 곧바로 똑같은 잔디로 빈틈없이 메우기 때문이다. 잔디 밑에는 토양의 습도 등을 조절하는 시설이 갖춰져 비가 내려도 금방 흡수된다.
이제 홀까지 남은 거리 50야드 정도. 세번째 샷은 56도 웨지로 충분했다. 10㎝짜리 ‘초대형 디봇’을 남기고 날아간 공은 홀 왼쪽 11야드 거리에 딱 떨어졌다. 동반자 중 유일한 '3온'. 파 찬스였다.
그린 스피드 4.5m…이게 실화냐

올해 마스터스 대회에서 만난 호주교포 이민우는 "체감상 그린스피드가 15피트(4.5m) 이상인 것 같다"고 했다. 한국 골프장의 그린 스피드는 대개 2.5m 안팎. 빠른 곳도 3m 초반이다. 마스터스 그린을 놓고 “왁스칠한 자동차 보닛”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타이거우즈가 1995년 마스터스대회 첫 출전을 앞두고 왜 미끈한 농구장 바닥에서 퍼팅 연습을 했는 지 알 것 같았다. 타이거 우즈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오거스타 그린에 대비해 퍼팅 훈련을 하려면 부엌의 타일 바닥이 제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스타GC가 ‘빠른 그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공기순환장치에 있다. 18개 그린마다 공기순환장치를 바닥에 설치, 습기를 완벽하게 빨아들이는 것. 잔디를 자주 깎고 누르는 건 기본이다. 마스터스 대회기간에는 매일 그린을 8번 깎고, 한번 눌렀다고 한다. 일반 골프장은 하루 두번 깎고, 한번 누른다는데. 오거스타GC가 일반 골프장엔 한 대면 충분한 ‘그린 롤러’를 12대나 들여놓은 이유다. 속도도 이겨내기 힘든데, 구겨놓기까지 했으니, 4~5퍼트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당연한 일이다.
어라? 분명 '퍼팅 뒤땅'이었는데…퍼팅 라인은 기자가 직접 봤다. 뒤에서 지켜보던 월터가 앞으로 오더니 엄지를 치켜들었다. "존(기자의 미국 이름), 11야드야. 평소 치던 힘의 60%만 주면 돼."
그린스피드 4.5m, 한국 골프장 2배
'덜 쳤다' 실망했지만, 공은 홀 옆에
얼떨결에 1번홀서 보기로 '선방'
심호흡을 하고 스트로크. 아뿔싸. 핑 퍼터는 공보다 그린 바닥을 먼저 때렸다. 100돌이도 안한다는 '퍼팅 뒤땅'. 하지만 공은 멈출듯 말듯 계속 굴렀고, 홀 앞 30㎝ 앞에 섰다. 동반자들은 박수소리와 함께 "존, 골프 선수를 하다 기자가 된거냐”는 농도 쳤다.
1번홀 보기. 올해 2라운드 1번홀에서 보기를 한 타이거 우즈와 동타이자, 같은 날 더블 보기를 적어낸 게리 우들랜드(2019 US오픈 챔피언)를 뛰어넘은 성적표다.
‘텍사스 웨지’로 승부
1번홀 티샷을 칠 때의 ‘극한 긴장’은 더 이상 없었다. 그러자 스윙이 살아났다. 2번홀(파5·515야드)의 첫 샷(드라이버)과 두번째 샷(3번 우드) 모두 페어웨이에 떨어졌다. 세번째 샷(7번 아이언)도 잘 맞았지만, 그린을 살짝 넘어갔다. 3년전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81타)를 기록했을 때의 ‘손맛’을 느꼈다."그린 주변선 웨지 쓰는 게 아냐"홀까지 남은 거리는 약 13야드. 월터에게 웨지를 청했지만, 돌아온 건 퍼터였다. "오거스타 그린 주변에선 함부로 웨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 아마추어 중에 제대로 컨트롤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
"그린 밖 잔디도 유리알 같다"며
웨지 달라고 하자 퍼터 내밀어
'텍사스 웨지' 전략으로 파 낚아
그린 밖에서 퍼터로 공략하는 '텍사스 웨지' 작전 명령이 떨어진 것. 이곳에서 12년동안 캐디로 일한 월터의 경험을 뿌리칠 이유가 없었다. 그러고보니 공이 놓인 그린 주변 잔디는 일반 골프장의 그린과 맞먹을 정도로 미끈했다. “그린에서 칠 때보다 10%만 힘을 더 주면 돼.”
직전 홀에서 퍼팅 뒤땅을 경험한 기자는 월터가 얘기한 것보다 더 살살 쳤다. 그야말로 툭 대기만 했다. 그런데도 오르막 10m를 굴러 홀 2m 앞에서 딱 섰다. ‘파’였다.
3번홀에서도 텍사스 웨지 작전으로 보기를 낚았다. 마스터스에 13번 출전한 톰 레먼은 "마스터스에선 모든 그린마다 요구하는 샷이 다르다"고 했지만, 기자에겐 '퍼터' 하나면 충분했다. 3번홀까지 보기-파-보기로 2오버파. 올해 타이거 우즈의 2라운드 1~3홀 스코어(보기-파-보기)와 똑같은 결과에 어깨가 으쓱했다.
1번홀부터 '더블파'를 한 립튼 기자, 3번홀까지 10타 정도 잃은 그레이브스 기자, 장타라며 거들먹 거리다 트리플 보기를 연달아 적어낸 그렉 셰머스 게티이미지 기자를 향해 '승자의 미소'를 날렸다. 이 곳에서 100타 정도 친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도 우습게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다. 그렇게 자만심에 취해 곧이어 프로 선수들에게도 ‘지옥’으로 불리는 ‘헬렐루야’ 코스와 악명 높은 ‘아멘 코너’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3회) '헬렐루야'로 불리는 '할렐루야' 코스의 좌절에서 계속
5%의 사나이 조희찬은
평균타수 90…비거리는 200m
전 세계 기자 500명 중 28명만이 당첨. 5% 확률의 라운드 기회를 얻은 조희찬은 11년차 아마추어 골퍼이자 8년차 골프 기자다. 박인비, 리키 파울러와 같은 1988년생이다. 로리 매킬로이보다 한 살 형이다. 키 182㎝, 몸무게 100㎏으로 임성재(183㎝, 90㎏)보다 조금 더 무겁다. 평균 비거리는 200m. 핸디캡은 +18로 ‘보기 플레이어’다. 라이프 베스트는 81타. 오거스타GC 라운드 기회를 얻기 전까지 가장 좋은 ‘뽑기’ 성적은 로또 4등(5만원)이었다.골프 기자로서의 목표는 두 가지다. 타이거 우즈 단독 인터뷰와 30년 뒤에도 골프 기자를 하는 것이다.
▶ (1회) 꿈의 오거스타 라운드…로또에 당첨되다
▶ (3회) 지옥 같은 '헬(hell)렐루야'…악명 높은 오거스타 '바람의 심술'
▶ (4회·끝) 우즈가 인생 최악 샷 날린 12번홀, 보란듯 그린에 올렸지만…
오거스타(미국 조지아주)=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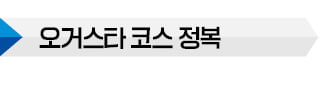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