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자의 오거스타 도전기 ③…지옥 같은 '헬(hell)렐루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희찬 기자의 오거스타 도전기
(3) 지옥 같은 '헬(hell)렐루야'
악명 높은 오거스타 '바람의 심술'
세 클럽 길게 잡고도 그린 놓쳐
(3) 지옥 같은 '헬(hell)렐루야'
악명 높은 오거스타 '바람의 심술'
세 클럽 길게 잡고도 그린 놓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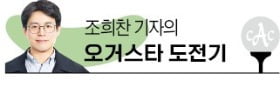
직접 느껴보니 더 무서운 '바람'이런 ‘오거스타의 바람’을 4번홀에서 만났다. '헬(hell)렐루야 코너'로 불리는 4~6번홀의 출발점이다. 원래 4~6번홀은 오거스타GC에서 가장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 버디를 낚은 선수들의 '할렐루야' 외침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모습이 꼴 사나웠는 지, 오거스타GC는 이들 홀의 전장을 차츰차츰 늘리기 시작했다. 선수들이 “지옥(hell) 같다”고 느낄 때까지. 그렇게 205야드였던 4번홀(파3)은 240야드로, 455야드였던 5번홀(파4)은 495야드가 됐다. 선수들에게 미안했는 지, 오거스타GC는 세 홀중 가장 어려운 6번홀(파3·180야드)만 내버려뒀다.
오거스타 고저차가 만든 바람
원래 치던 것보다 40야드 덜 나가
프로들도 떨던 '바람의 위력' 실감
러프보다 무서운 오거스타의 바람
4번홀 멤버 티에서 홀까지 거리는 170야드. 4번 아이언으로 넉넉한 거리다. 캐디 월터는 “4번이 170야드면, 제일 큰 채로 쳐야겠다”며 3번 우드를 건넸다. 평소 200~210야드를 칠 때 드는 채다. “40야드는 더 봐야 해. 바람이 만만치 않거든. 있는 힘껏 쳐.” 월터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티박스에선 별로 바람을 느낄 수 없는데….속는 셈 치고 3번 우드로 힘껏 때렸다. 제대로 맞았을 때의 ‘손맛’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린을 지나치리란 걱정은 기우였다. 쭉쭉 뻗어나가던 공은 마치 바람 맞은 종이비행기처럼 힘을 잃더니 그린 왼쪽에 뚝 떨어졌다. 딱 170야드 선상이었다. 고개를 돌리니, 월터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제서야 “바람 때문에 거리를 가늠하기 힘들었다”는 임성재 선수의 얘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1984년과 1995년 두차례 마스터스를 제패한 벤 크렌쇼가 “오거스타의 바람은 골퍼들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공을 친 뒤 기도하게 만든다”고 왜 말했는 지 고개가 끄덕여졌다. 또 다른 두차례 우승자인 베른하르트 랑거(1985, 1993년)는 “기상 예보는 분명히 남서쪽으로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홀의 깃발은 반대방향을 가르켰다”고 했다지. 월터는 “오거스타는 다른 골프장보다 러프가 쉬운 대신 다른 골프장엔 없는 바람이란 변수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그린 밖에서 퍼터로 어프로치샷을 하는 ‘텍사스 웨지’ 전략을 썼다. 보기로 마무리.
5번홀 멤버 티 전장은 400야드로 세팅됐다. 드라이버로 230야드 이상 보내지 않으면, 두번째 샷에 그린에 올리는 ‘투 온’이 어려운 홀이다. 왼쪽으로 휘는 도그렉(dog leg) 형태라, 티샷을 이 정도까지 보내야 깃발을 보고 세컨드 샷을 칠 수 있다. 기자의 티샷은 200야드 정도에서 멈췄다. 95야드 뒤에서 기자보다 50야드 더 멀리 보내는 프로들이 새삼 존경스러웠다. 5번홀은 ‘드라이버-3번 우드-웨지-2퍼트’로 보기를 적어냈다. 타이거 우즈가 얼마전 이 홀에서(마스터스 3라운드)에서 4퍼팅을 하며 더블보기를 적어낸 걸 떠올리며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무너진 평정심…쏟아지는 미스샷

맞바람이 있다는 얘기에 5번 아이언으로 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공이 그린 뒤 13m 거리에 떨어진 뒤에야 후회가 밀려왔다. 홀을 향해 걷다보니 경사가 얼마나 심한 지 알 수 있었다. 우즈가 나흘 내내 다리를 절뚝이며 내려갔던 이유가 있었다. 다리가 성한 기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 발가락에 힘을 ‘빡’ 줘야 했다. 내려간만큼 다시 올라가니 그린이 나왔다. 홀은 'V'자 모양이었다.
고집을 부린 대가는 혹독했다. 그린 뒤에서 하는 어프로치가 조금만 세도 내리막 경사를 타고 그린 밖으로 떨어지는 구조였다. "무조건 오르막 퍼팅을 노려야 한다"(데이미드 마허 아쿠쉬네트 최고경영자)는 얘기를 그저께 들었는데, 그새 까먹었다.
6번홀 퍼팅만 4번…첫 더블 보기그동안 재미를 본 텍사스 웨지 작전을 또 쓰기로 했다.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또 ‘퍼터 뒤땅’이 나왔다. 너무 살짝 건드린 탓에 공은 5m도 못 가 멈췄다. 그린 입구도 넘지 못했다. ‘철퍼덕’에 평정심을 잃자, 힘 조절이 안됐다. 갖다 댄 것 같은데 공은 홀을 지나 내리막 경사를 타고 그린 밖으로 나갔다. 8m 파 찬스는 20m 보기 퍼트로 변해 있었다. 결국 4온 2퍼트. 첫 더블 보기였다.
캐디 월터 "길게 치면 낭패" 조언
고집부려 쳤더니 그린 뒤까지 날아
8m 파 찬스가 20m 보기 퍼트로
석영 벙커에 눈이 멀다
헬렐루야 코스를 돌아나오자, 짧은 파4홀(330야드)이 기자를 맞았다. ‘드라이버-피칭-2퍼트’로 파를 낚았다. 오거스타GC의 벙커를 처음 밟은 건 8번홀(파5·480야드)에서였다. 멤버 티에서 200m 정도 오른쪽으로 날리면 벙커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는데, 딱 그렇게 쳤다.
벙커와 '첫인사'…멘탈 무너지다오거스타GC의 벙커는 ‘유리알 그린’이나 ‘종잡을 수 없는 바람’만큼은 아니어도, 위협적인 함정 역할을 한다. 2003년 마스터스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2타 차 선두를 달리던 제프 매거트를 쓰러뜨린 게 바로 페어웨이 벙커였다. 당시 벙커 턱에 맞고 튄 공이 자신의 가슴을 때려 2벌타를 맞으면서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설탕 벙커' 비밀은 모래 아닌 석영
페어웨이 벙커인데도 높이 1m
티샷 빠져…턱 맞고 탈출도 실패
오거스타GC는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석영을 구하기 위해 직접 광산을 찾는다. 이렇게 빛나는 오거스타의 벙커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기도 했다. 2012년 마스터스 대회를 찾은 갤러리가 맥주 컵에 오거스타GC의 모래를 담았다가 절도죄로 체포된 것. 2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풀려난 그는 이후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실제 마주한 벙커는 위협적이었다. 페어웨이 벙커인데도 높이가 1m에 달했다. 1야드라도 더 보내겠다는 생각에 5번 아이언을 들었다. 월터는 9번 아이언을 권했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페어웨이 벙커 샷”이라며 뿌리쳤다. 아마도 눈 부시게 빛난 석영에 눈이 멀었던 것 같다. 벙커 턱을 맞은 공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기자의 손에는 직전 샷에 잡았어야 할 9번 아이언이 들려 있었다. 5온 2퍼트. 이번에도 더블 보기였다.
괜찮았던 리듬이 무너진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으로 ‘몸통 스윙’을 계속 되뇌였지만, 실제론 팔로만 쳤다. 9번홀(파4·395야드) 티샷은 왼쪽으로 감겨 솔잎 러프에 떨어졌다. 3번 아이언으로 끊어친 세컨드 샷은 나무 밑둥을 맞았다. 그나마 페어웨이 쪽으로 뱉어준 게 고마울 따름이었다. 4번만에 그린 위에 공을 올렸지만, 이번에도 3퍼트. 첫 트리플 보기였다. 전반 성적은 ‘11 오버’였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다시 10번홀(파4·450야드) 티박스에 올랐다. 왼쪽으로 급격하게 휘는 내리막 홀. 네명 모두 왼쪽으로 감겼다. 전원 O.B. 다음 티샷은 모두 살았지만, 결과는 뻔했다. 다시 트리플 보기. 두 홀에서 6타를 잃었다.
‘정신 차리자. 더 이상 점수 잃지 말자.’ 양 손으로 두 뺨을 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월터가 다가와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존(기자의 미국 이름), 마음 편하게 먹어. 이제부터 ‘아멘 코너’(너무 어려워서 아멘 소리가 난다는 11~13홀)야."

5%의 사나이 조희찬은
평균타수 90…비거리는 200m
전 세계 기자 500명 중 28명만이 당첨. 5% 확률의 라운드 기회를 얻은 조희찬은 11년차 아마추어 골퍼이자 8년차 골프 기자다. 박인비, 리키 파울러와 같은 1988년생이다. 로리 매킬로이보다 한 살 형이다. 키 182㎝, 몸무게 100㎏으로 임성재(183㎝, 90㎏)보다 조금 더 무겁다. 평균 비거리는 200m. 핸디캡은 +18로 ‘보기 플레이어’다. 라이프 베스트는 81타. 오거스타GC 라운드 기회를 얻기 전까지 가장 좋은 ‘뽑기’ 성적은 로또 4등(5만원)이었다. 골프 기자로서의 목표는 두 가지다. 타이거 우즈 단독 인터뷰와 30년 뒤에도 골프 기자를 하는 것이다.▶ (1회) 꿈의 오거스타 라운드…로또에 당첨되다
▶ (2회) 우즈도 떤 '유리알 그린' 실감…이게 실화냐
▶ (4회·끝) 우즈가 인생 최악 샷 날린 12번홀, 보란듯 그린에 올렸지만…
오거스타(미국 조지아주)=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