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직 살아있어요"…6년 만에 재상장 계획 밝힌 '야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짐 랜존 CEO, FT 인터뷰서 "재정적 준비 끝나"
버라이즌 매각으로 나스닥서 자취 감춘지 6년만
"공격적 M&A 모색…AI가 새 기회 제공하고 있어"
버라이즌 매각으로 나스닥서 자취 감춘지 6년만
"공격적 M&A 모색…AI가 새 기회 제공하고 있어"

짐 랜존 야후 최고경영자(CEO·사진)는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야후는 재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수익성은 매우 높고, 대차대조표 역시 균형적”이라며 재상장 계획을 밝혔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에 매각됨과 동시에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지 6년 만이다.
야후는 설립 이후 약 2년 만인 1996년 4월 나스닥에 상장됐다. 당시 야후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터넷 기업이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동아시아, 캐나다,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랐고, 이에 힘입어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꺼짐과 동시에 야후의 전성기도 서서히 막을 내렸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470억달러(약 61조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주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공동 창업자였던 제리 양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다. 그 이후 5년간 CEO가 5차례 바뀌는 등 혼란은 거듭됐다.
결국 야후는 2017년 미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에 매각됐고, 증시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2015년 아메리카온라인(AOL)에 이어 야후까지 사들인 버라이즌에겐 두 기업을 합쳐 구글 등에 맞먹는 미디어 기업을 탄생시키겠다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거듭된 경영 악화로 목표 달성은 멀어져 갔다. 2021년 버라이즌은 야후와 AOL를 사모펀드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에 통째로 팔았다. 매각 가격은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로, 인수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다.

랜존 CEO는 “공모 시장이 아닌 사모 시장에 머무르는 동안 야후는 필요했던 구조 개혁에 성공했다”며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우리는 최고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이 모든 제품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랜존 CEO는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업 분야에서 M&A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야후는 스포츠 베팅 앱인 와그르(Wagr)를 인수했다. 랜존 CEO는 “우리는 매우 의욕적”이라며 “이미 보유한 사업을 수직 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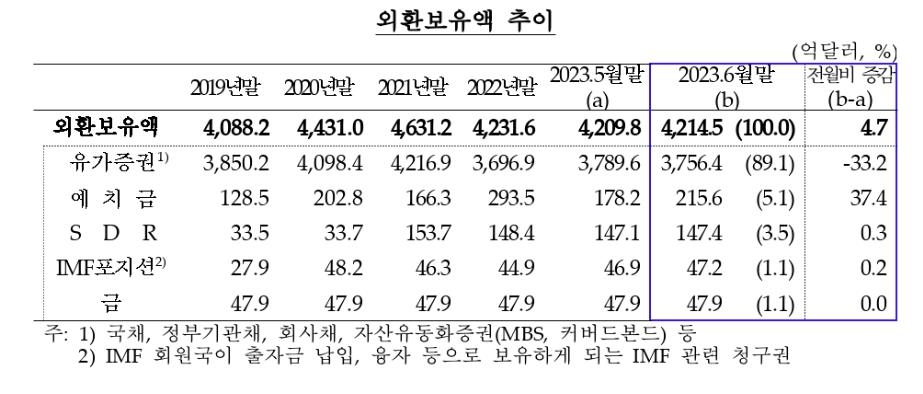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