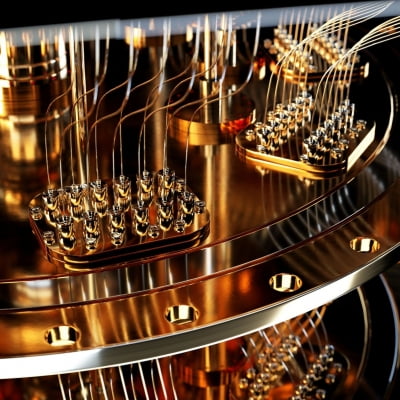2008년 '피처폰 성장'에 안주
스마트폰 돌풍 조짐에도 대응 늦어

A씨는 감정가를 듣고 놀랐다. 출고가가 80만원대였던 LG G시리즈의 중고가격은 2만원이었다. 출고가 30만원대로 공시지원금을 고려하면 ‘공짜 폰’이나 다름없었던 삼성 J 시리즈의 중고가격은 5만원으로 더 비쌌다.
판매점 직원은 “중고 스마트폰의 주요 매입자인 중국인들이 삼성 제품을 훨씬 선호한다”며 “LG 중고폰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수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고장이 많기로 악명이 높다”고 했다.
이 같은 일화는 LG 스마트폰의 국내외 시장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지난 1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이를 견디다 못해 국내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이다. LG전자는 국내 평택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아이폰을 선보였다.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 인터넷, 휴대폰이 합쳐진 기능에다 터치스크린으로 동작하는 입력장치를 적용한 제품이었다. 2009년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했다. 삼성전자는 발칵 뒤집혔다. 이건희 회장이 아이폰을 내던지며 “베끼더라도 빨리 만들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삼성전자는 1세대와 2세대 제품 개발에 동시에 착수했다.
LG전자의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당시 LG 피처폰은 승승장구했다. 2005년 초콜릿폰이 1000만 대 이상 팔리며 대박을 쳤다. 2006년 샤인폰, 2007년 프라다폰까지 연이어 성공하며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었다.
2008년엔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모토로라를 누르고 노키아, 삼성전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승리감에 도취된 LG전자는 아이폰을 ‘찻잔 속 태풍’으로 취급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맥킨지의 보고서를 철석같이 믿었다.
당시 LG전자를 이끌던 남용 전 부회장은 ‘선택과 집중’을 이유로 그나마 있던 스마트폰 연구개발(R&D) 인력을 정리했다. 피처폰에 안주하는 바람에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
브랜드·마케팅·혁신 실패
LG전자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2009년부터 급팽창한 스마트폰 시장 대응에 늦어 2010~2011년 암흑기를 보냈다. 2009년 오너가인 구본준 부회장이 부임해 옵티머스와 G시리즈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중심의 체질 개선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09년까지 10%를 넘었던 LG 휴대폰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10년 7%로 쪼그라들었고 2012년엔 3.3%로 고꾸라졌다.
이후 체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단기적이었다. 2014년 G3가 히트하며 MC사업본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LG전자는 휘어지는 화면을 적용한 ‘G플렉스’, 각 부분을 모듈처럼 조립해서 쓸 수 있는 ‘G5’ 등을 내놓으며 틈새시장을 노렸지만 흥행에 실패했다.
이미 삼성전자와 애플 양강 구도로 고착화한 시장을 뒤집기가 어려웠다. 세계 시장에선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업체에도 밀려났다. 고급폰은 물론 중가폰에서도 존재감이 약해졌다.
LG 스마트폰의 ‘아킬레스건’은 약한 브랜드 파워다. 네티즌 사이에선 “LG전자가 겸손해 제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농담이 떠돌 정도다. 황정환 전 LG전자 MC사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LG전자 스마트폰만의 강력한 브랜드가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접을 수도 없는 ‘계륵’
브랜드 전략의 실패는 판매 감소로, 다시 R&D 여력 축소로 이어졌다. 제품 혁신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는 뜻이다. LG전자는 이번달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V50 씽큐’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완성도 문제 등 탓에 결국 연기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누적 적자는 3조원에 달한다. 증권가에선 올해 1분기에도 2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수순이란 관측도 나온다.
LG전자 측은 부인했다.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5G·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홈, 자율주행자동차 사업 등에서 스마트폰과 통신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