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 370m 크기 '아포피스'
2029년 3만7천㎞ 거리로 접근
지구 가까워 연료 아낄수 있어

한국도 소행성 탐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탐사 대상은 지난 6일 1680만㎞ 거리로 지구를 스쳐 지나간 지름 370m의 석질 소행성 아포피스다. 아포피스는 2029년에는 이번보다 훨씬 가까운 3만7000㎞ 거리로 지구를 지난다. ‘천리안’ ‘무궁화’ 등 정지궤도 위성보다 약 4000㎞ 더 가까운 거리다. 아포피스 크기의 소행성이 이 정도로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10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어 탐사에 유리하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029년에 탐사를 추진하겠다는 밑그림을 지난 1월 공개했다.
이 시기 탐사가 유리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소행성 탐사를 통해 유의미한 과학적 성과를 얻으려면 표면 아래를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 소행성의 표면은 태양풍이나 우주선의 고에너지 입자들에 의해 생성 이후 끊임없이 풍화돼 왔다. 태양계가 처음 형성됐을 때의 모습과는 달라진 것이다. 일본의 하야부사2가 류구에서 금속탄환으로 웅덩이를 만든 뒤 내부 물질을 채취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029년에는 총알 등으로 표면을 파내지 않고도 아포피스 내부 물질을 조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구 중력으로 인한 조석력(주위의 행성 또는 위성이 당기는 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명진 천문연 선임연구원은 “산사태가 발생한 아포피스의 지형을 자세히 관찰하면 한 번도 태양빛에 노출되지 않은 소행성 내부 물질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포피스 탐사가 현실화한다면 탐사선엔 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편광카메라, 색까지 파악하는 다중대역카메라 등이 탑재될 전망이다. 천문연은 초소형 로봇을 표면에 보내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아포피스 탐사에는 지구 방위 목적도 있다. 아포피스는 2004년 미국 국립광학천문대가 처음 발견한 이후 지구와의 충돌 위험이 가장 큰 소행성 중 하나로 분류돼 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포피스는 100년 안에 지구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천체 네 개 중 하나다. 2029년 충돌 확률은 38만분의 1로 희박하다. 그러나 6~7년 주기로 공전하는 이 소행성이 다음번에 지구와 가깝게 지나가는 2036년과 2068년의 충돌 확률은 시시각각 다르게 계산되고 있다.
소행성의 궤도는 태양빛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공전궤도가 달라지는 ‘야르콥스키 효과’ 때문이다. 지구 중력의 영향도 클 전망이다. 각종 요인으로 변화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선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세한 형태는 가까이 다가가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천문연은 소행성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관측하는 ‘동행비행’을 통해 정밀 영상을 획득한다는 목표다.
한국의 아포피스 탐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천문연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 연구를 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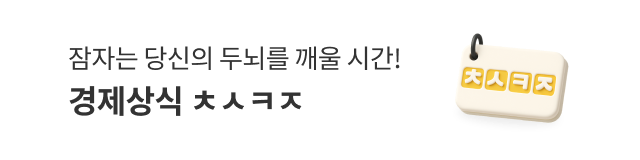


![[이미아의 독서공감] 버거운 삶을 위로하는 밤 하늘 별들의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A.2575876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