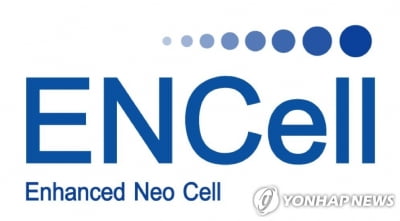"돈 쉽게 번다" SNS에서 파다
1년여 만에 회원 170만명 늘어
글로벌 IT 플랫폼 노리는 틱톡
K팝 콘텐츠 영향력 보고 투자
회원 수 작년 250만→올해 420만 명
9일 IT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신규 이용자 확보를 위한 ‘틱톡 코리아 친구 초대 이벤트’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규 회원(친구)을 초대하는 기존 가입자에게 최대 8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처음 시작한 것. 해당 포인트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틱톡 관계자는 “관련 예산과 그동안 쓴 비용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의 국내 이용자 수(MAU)는 이벤트 시작 전인 지난해 1월 250만 명에서 올 6월 420만 명으로 68% 증가했다.
“한국 회원이 올리는 동영상 인기 높다”
국내 플랫폼 회원 확보 경쟁 역사도 달아오른 건 비슷하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몇 십원에서 몇 백원어치의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한 적이 있다. 하지만 1인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현금 살포’성 파격 마케팅은 찾기 어렵다. 특히 다른 국가보다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대목이다. 틱톡은 방글라데시에서 친구 초대 1인당 최고 600타카(약 8000원)를 지급하고 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해도 한국(8만원)이 훨씬 많은 액수다. IT업계 관계자는 “친구 초대 보상액이 가장 큰 지역이 한국으로 알려졌다”며 “그만큼 틱톡이 한국 회원의 가치를 다른 국가 회원보다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음악과 동영상이 틱톡의 주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틱톡에는 특정 음악에 이용자들이 춤을 추는 콘텐츠가 가장 많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관련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용자가 압도적인 틱톡이 고객 연령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틱톡의 친구 초대 이벤트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중국 앱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논란이 커졌고 반중(反中) 정서가 강해지면서 틱톡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심성 현금 이벤트를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은 시장 포기?
틱톡은 현재 글로벌 쇼트폼 플랫폼 1위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최근 틱톡처럼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페이스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은 지난 2월 비슷한 서비스인 ‘릴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구글의 유튜브도 3월 쇼트폼 서비스인 ‘쇼츠’를 정식으로 내놨다. 파격 현금 마케팅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퍼즐이다.외국 기업의 공세에도 국내 기업들은 잠잠하다. 동영상 콘텐츠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조차 대항마가 되지 못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유튜브 선탑재를 앞세워 국내 동영상 유통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업체가 관련 서비스에서 힘을 쓰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