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가 만든 '천연 끈끈이'…1억 배 빠른 '빛 반도체' 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테크 & 사이언스
韓·美 연구진 '차세대 광소자 기술'
정전기로 결합된 '반데르발스 물질'
강한 빛 가해 광학적 성질 변화 발견
"반도체 상용화 땐 전력 확 줄어
탄소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
韓·美 연구진 '차세대 광소자 기술'
정전기로 결합된 '반데르발스 물질'
강한 빛 가해 광학적 성질 변화 발견
"반도체 상용화 땐 전력 확 줄어
탄소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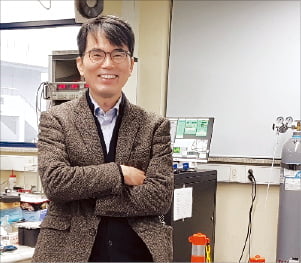
한·미 공동 연구진이 반데르발스 물질을 이용해 ‘광(光) 반도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제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사진)와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캘리포니아공대 연구팀이 광 반도체에 쓸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세계 3대 학술지 ‘네이처’ 9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벌집 형태 평면구조를 가진 반데르발스 물질 ‘삼황화인망간(MnPS3)’을 이용했다. 여기에 10억볼트 이상의 강한 전기장을 지닌 빛을 가하면 광학적 성질이 크게 변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를 네이처가 주목한 이유는 실리콘 반도체 집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실마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동작의 기본 원리는 ‘전자의 이동에 따른 디지털 신호’ 전달이다. 현재 나노미터(㎚·1㎚=10억분의 1m)급 선폭을 가진 반도체엔 수십~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 정보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트랜지스터를 고밀도로 집적하면 발열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회로 선폭을 줄이지 못하는 한계점이 온다.
이 때문에 ‘전자의 이동’을 ‘빛의 이동’으로 바꿔 반도체를 설계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광전자공학(옵토일렉트로닉스)이다. 30여 년 전 처음 등장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빛은 직진성이 강해 전자보다 컨트롤이 훨씬 힘들다. 회로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전자는 길을 잘 찾아가지만, 빛은 그렇지 않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를 1940년대 등장한 대형 전자 컴퓨터 ‘에니악’에 비유했다. 에니악이 수십 년에 걸쳐 현재 노트북, 스마트폰 크기로 작게 진화한 것처럼 광 반도체도 미래에 상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빛을 이용해 반도체를 만들면 전자 기반 반도체보다 이론적으로 1억 배 이상 빨라진다”며 “구동 전력이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적어 대형 서버 가동 시 발생하는 탄소 저감에도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양자과학기술 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 교수는 지난해 양자정보통신 원천기술도 선보였다.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에 정보를 실어보내 도·감청이나 해킹이 불가능한 차세대 통신기술이다. 박 교수는 반데르발스 물질인 삼황화인니켈에서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나뉘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전자는 한 개의 원자에 종속된다는 정설을 뒤집은 연구 성과다. 이 논문도 네이처에 실렸다.
박 교수팀은 삼황화인니켈에서 매우 강한 ‘엑시톤’ 신호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엑시톤은 전자와 정공(양전하 운반체)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돼 있는 양자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전자와 정공이 결합하는 순간 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엑시톤은 양자정보통신에 중요한 열쇠로 꼽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