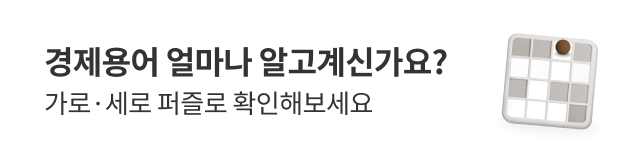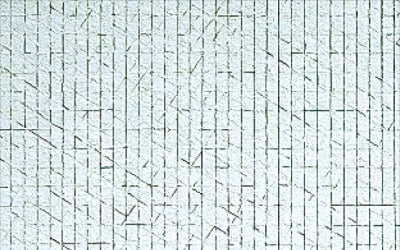1950년대 이후 추상화 도입한
시대·지역별 선구자 입체 조명
한국적 특색 '자기화의 몸부림'
학고재갤러리서 내달6일까지

서울 삼청동 학고재 본관과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도스(eidos)를 찾아서: 한국 추상화가 7인’은 한국 추상미술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기획전이다. ‘에이도스’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사물에 내재하는 본질을 가리키는 용어. 대상의 본질을 좇는 추상화의 속성을 담은 전시 제목이다.
김복기 경기대 교수(아트인컬처 대표)가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한국 추상미술의 문을 연 이봉상(1916~1970), 류경채(1920~1995), 강용운(1921~2006), 이상욱(1923~1988), 천병근(1928~1987), 하인두(1930~1989), 이남규(1931~1993) 등 작고 작가 7명의 작품 57점을 선보였다. 추상미술과 관람객 간 거리를 크게 좁힐 귀중한 기회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다양한 추상화를 남긴 이들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단색화가 등장하기 전에 추상화의 물꼬를 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로부터 유입된 추상회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 한국적 양식을 이룩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과 황해도, 전남과 충청, 경남·북, 함경도 등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작품에 담아냈지만 묘하게도 공통되는 점이 적지 않다. 추상화를 자기화하는 몸부림 속에서 ‘한국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것.
전시장 입구 부근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이봉상의 1963년 작 ‘나무Ⅰ’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겹게 가지를 뻗은 나무의 형상이 남아 있다. 이후 추상화가 심화한 1968년 작 ‘미분화시대2’에선 식물 열매의 절단면이나 세포의 모습이 연상되는 형태로 전환한다. 하지만 여전히 마당에서 딴 열매나 푸른 잎이 절로 연상된다.

추상화라는 새로운 세계를 체화하기 위한 자기화 과정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한데 녹여내는 작업이 수월할 리 없었다.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동양적 정서를 화폭에 옮겼던 류경채 화백의 기하학적 추상회화 ‘날 85-6’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자연의 정감이 살아 있다. 일필휘지의 필력이 전해지는 이상욱 화백의 ‘봄-B’에서 전해지는 감흥은 서구 작가들의 액션 페인팅과는 확연히 다르다.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며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에 심취했던 이남규 화백은 색유리를 통과하는 듯한 점과 선으로 성스러운 빛의 세계를 연출한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어 외부 공개가 쉽지 않았던 작품도 다수 나왔다. 작가들의 생전 기록과 상호 교류, 전시 활동 등의 내막을 살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아카이브 섹션도 따로 마련했다. 불교와 가톨릭으로 종교는 달랐지만 절친했던 하인두·이남규 화백의 주요 작품만 따로 모아 함께 전시하는 등 작가들의 남다른 인연을 되살리는 데도 공을 들였다.
추상의 세계라고 해서 무(無)에서 유(有)로 불쑥 창조될 수는 없는 법. 예술가의 작품은 주변의 삶과 문화의 자양 속에서 꽃을 피운다. 한국 추상회화의 형성과 지평 확장에 크기 기여했던 ‘원조’들의 작품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진리가 눈에 뚜렷이 들어온다. 화가의 붓끝에서 태어난 점과 선, 원과 사각형은 그렇게 우리 가슴에 따스하게 녹아든다. 전시는 다음달 6일까지.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