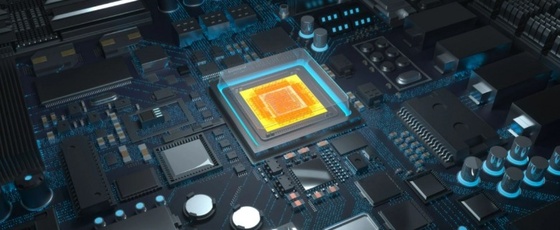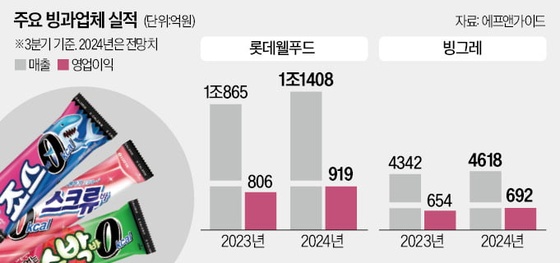'미술시장의 역설'…중·저가는 펄펄, 대작들은 찬바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잇따라 유찰·출품취소
70억원 리히텐슈타인 출품 취소
박서보·이우환도 수차례 유찰
시세 차익 노린 'MZ컬렉터'
재판매 쉬운 1억 이하 싹쓸이
자산시장 불황…지갑 닫은 큰 손
그림값 너무 올라, 인기작 안나와
"미술작품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지만 요즘 국내 미술시장에선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으로 치면 ‘동전주’나 ‘지폐주’ 정도였던 작가들의 작품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거장들의 작품 중 상당수가 살 사람을 못 찾아 경매 출품이 취소되거나 유찰되고 있다. 중저가 작품 가격은 ‘신흥 부자’가 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의 탄탄한 수요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고가 작품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큰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쌀수록 안 팔린다”
모든 경매나 아트페어는 구매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간판 작품’을 내건다. 행사의 얼굴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보통 유명 작가의 대표작을 내건다. 이런 작품이 안 팔리면 큰 망신이다. 경매업체 관계자는 “대표작의 경우 대개 구입할 사람을 미리 확보한 다음 경매를 진행한다”며 “이런 경우 수수료를 깎아주기도 한다”고 귀띔했다.그런데 올 들어 이런 작품들이 줄줄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 케이옥션 경매에 나오기로 했던 김환기의 ‘항아리’(2월·추정가 12억~20억원), 이중섭의 ‘닭과 가족’(3월·시작가 14억원) 등 ‘국가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서울옥션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던 파블로 피카소의 정물화(4월·25억~35억원), 아트부산에 출품될 예정이었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Purple Range’(5월·70억원) 등이 행사 직전 출품이 취소됐다. 국내 미술시장의 ‘대장주’인 이우환과 박서보 작품도 최근 수차례 유찰됐다.
미술계가 설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자산시장 불황으로 큰손들의 돈줄이 마른 데다 ②그림 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③‘부르는 게 값’인 작품은 더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게 겹친 탓이란 설명이다. 황달성 화랑협회장은 “인기 있는 작품들은 지난해 호황 때 경매에 많이 나와 손바뀜을 했다”며 “시장에 새로 나올 만한 매력적인 물건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술시장을 떠받치는 건 신진·중견 작가들이다. 지난 27일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우국원의 ‘케세라세라’(3억원)와 심문섭의 ‘제시’(1억6000만원)가 나란히 기존 최고가를 깨는 등 몸값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두 작가 모두 2년 전만 해도 평균 작품 가격이 수천만원대였다. 미술계 관계자는 “상당수 MZ 컬렉터들은 수십억원짜리 작품에 대해 ‘너무 비싼 데다 재판매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 수천만~1억원대 작품을 긁어모으고 있다”고 했다.
“미술시장 불안정…안전자산 추천”
지난해 ‘이건희 컬렉션’ 감정평가에도 참여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세계 미술시장의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 끝나고 혼란의 시기가 왔다”는 분석을 내놨다. 센터는 최근 발간한 1분기 시장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 경매시장이 뜨거워 보이는 건 큰손 컬렉터들의 사망과 파산, 이혼 등이 우연히 겹쳐 걸작 매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 이혼한 미국 부동산 재벌 매클로 부부가 50년간 모은 현대 미술품을 경매에 내놓은 게 대표적인 예다. 당시 판매액은 1조1700억원(약 9억2200만달러)으로, 개인 소장품 경매 최고 기록을 새로 세웠다.센터는 “미술시장도 최근의 실물경제 및 자산시장 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한다. 센터는 “중국 정부가 억만장자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악재”라며 “중국 수요 감소로 명품시장이 쪼그라든 일이 미술시장에서 재연될 수 있다”고 했다.
정준모 센터 대표는 “1분기 세계 경매시장에서 팔린 그림의 48%(5억5000만달러)는 인상주의와 근대미술 등 불황기에도 현대미술에 비해 하락폭이 작은 ‘안전자산’이었다”며 “국내 컬렉터들도 수익성에서 안정성으로 투자 방향을 돌려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AI 열풍 가장 잘 활용할 소프트웨어 주식 3종목 [인베스팅닷컴]](https://d18-invdn-com.investing.com/content/picd835212bfb6c736a80d1f399212c584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