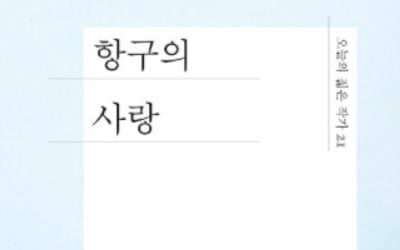퓰리처상 받은 갠더 "코로나 3년간 한국 시집 많이 읽었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강연 맡아
"이야기는 국경 없어…문학은 전 세계를 묶어준다
특히 좋은 번역은 모든 벽을 뛰어넘는다"
이상 등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 드러내
"미국 독자들, 한국 문학에 주목…
요새 美 시인이 김혜순 모른다면
시인인 척만 하고 있는 셈"
"이야기는 국경 없어…문학은 전 세계를 묶어준다
특히 좋은 번역은 모든 벽을 뛰어넘는다"
이상 등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 드러내
"미국 독자들, 한국 문학에 주목…
요새 美 시인이 김혜순 모른다면
시인인 척만 하고 있는 셈"

201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시인이자 번역가 포레스트 갠더는 지난 22일 서울 서교동의 한 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문학은 타인을 이해하고 상상하게 만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갠더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 행사는 서울을 무대로 한국 작가와 해외 작가들이 교류하는 자리다. 한국문학번역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주최한다.
올해 주제는 '월담 : 이야기 너머'다. 문학을 통해 언어와 국가를 뛰어 넘어 교류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총 35명의 작가(국내 작가 23명, 해외 작가 12명)가 대담, 토론, 낭독 등을 진행한다.
그가 한국을 찾은 건 3년 만이다.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초청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더니 그의 입에서 이상, 임솔아, 최돈미… 한국 시인들의 이름이 줄지어 나왔다.
"락다운(봉쇄령)으로 집에 갇힌 채 한국 시집을 많이 읽었어요. 최근 3년간 유난히 한국 시인의 책이 미국에 많이 번역됐거든요. 미국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간 번역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죠. 미국 도서 시장의 3%만이 번역서라고 들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다양성에 대한 미국 내 관심이 커지고, 한국의 번역 지원 노력이 쌓이면서 한국 문학을 즐기는 미국 독자들이 늘고 있어요."

갠더는 "김 시인의 시는 폭발적이고 강렬하다"고 평했다. 갠더는 몇 년 전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김 시인과 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시인은 2019년 아시아 여성 최초로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 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왜 갠더는 낯선 한국의 시를 굳이 찾아 읽을까. 연결과 공생은 갠더의 오랜 화두이자 시의 주제이다. 그가 지난해 출간한 시집 제목은 '두 배의 생(twice alive)'. 바위에 붙어 사는 이끼 비슷한 생물체 '지의류'가 주요 소재다.
그는 "지의류는 조류와 곰팡이가 합쳐진 공생생물인데, 결합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며 "사람 간의 관계도 '너를 사랑하면 내가 변화해버린다'는 점에서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가 지구상 모든 걸 지배하는 종족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다른 인간, 내 몸 속의 유산균, 피부의 세균 등과 공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약탈적(predatory)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시를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낯선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법을 익히게 되죠. 그런 노력을 멈추면 우리는 괴물이 돼버릴 거예요."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