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초월한 문제작…"이 책이 '원조 야설'로 보이시나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구은서의 이유 있는 고전
D.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정부가 판매 금지했던 '빨간책', 고전이 되다
D.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
정부가 판매 금지했던 '빨간책', 고전이 되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금기는 예술의 훌륭한 재료입니다. 신의 엄포에도 기어이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처럼, 예술가는 사회의 터부와 제약을 창작의 먹잇감으로 삼곤 합니다.
모든 인간이 결국 맞이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죽음’, 일상을 뒤흔드는 ‘재난’과 ‘비극’은 동서고금 예술가들이 사랑한 주제입니다. ‘범죄’와 ‘악’을 다룬 작품은 끊임 없이 윤리란 무엇인지 묻고요.
그 중에서도 ‘성(性)’은 매혹적인 금기입니다.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이를 관리하려는 사회 질서와 긴장 관계에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더했죠. 특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건 금지되다시피 했어요.
1928년 발표된 D.H. 로렌스의 장편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이런 금기를 깨부순 작품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 책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공개된 걸 생각하면, 약 100년 전 세상에 나온 이 소설은 여전히 도발적인 문제작입니다.

코니는 시골 마을에서 남편 클리퍼드 채털리를 간호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클리퍼드는 1차 세계대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코니는 그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해요. 남작 지위를 물려줄 아들을 원하는 남편의 묵인하에 몇몇 남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죠. 그러던 코니는 사냥터지기 멜로스와 계급을 초월한 사랑에 빠져듭니다.

로렌스는 이탈리아에서 최종본을 완성한 뒤 현지 출판사들로부터 성 묘사와 비속어를 들어내면 출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자기 돈을 들여 책을 냅니다.
영국과 미국에선 아예 출판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되려 독자의 관심에 불을 붙여요. 사람 마음이란…. 당시에는 책을 무단으로 복사한 불법 해적판이 난무했대요. 로렌스 사후 1959년에야 소송 끝에 미국에서 합법적 출판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히 야하기만 했다면 고전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겠죠.
로렌스는 성이라는 소재를 통해 ‘육체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돈, 기계, 이성이 지배하는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육체적 접촉, 내밀한 상호작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로렌스는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쓴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멋진 신세계>를 쓴 올더스 헉슬리 등 당대 지성인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이 같은 철학을 완성했어요.
작품 속 멜로즈는 코니와 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돈과 기계, 그리고 세상의 생명 없이 차갑고 관념적인 원숭이 작태에 맞서 싸우고 있다.’
남작 부인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고 사랑을 찾아 떠나는 코니의 캐릭터도 매력적이죠. 코니가 클리퍼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책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 조용하고 섬세하게 그녀는 뒤엉킨 그의 의식과 자신의 의식을 풀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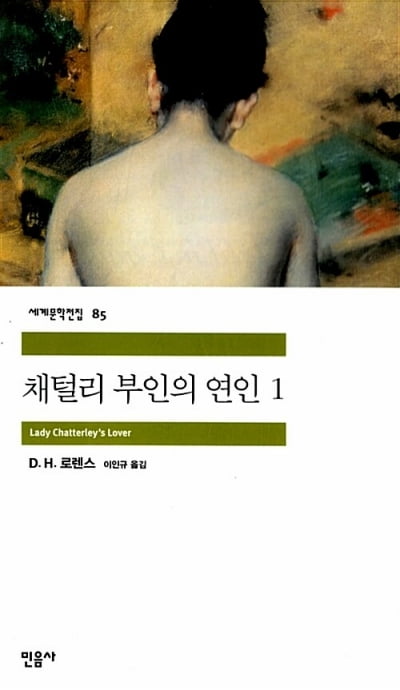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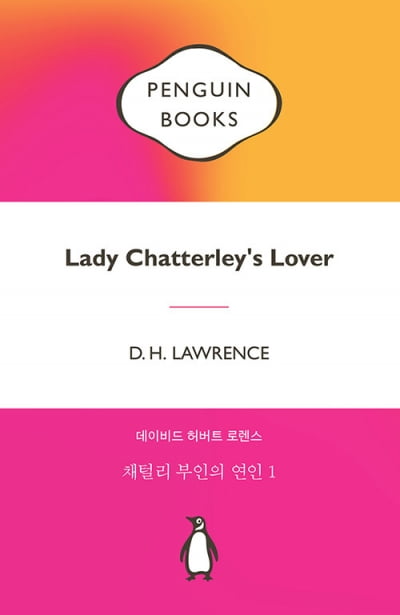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도발적인 이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 금기와 예술의 관계, 문명과 본능의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죠. 20세기에 쓰인 이 고전 작품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아직도 이 책이 '원조 야설'로 보이시나요?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푸틴의 잔인함은 '열등감' 때문"…러시아 최상류층의 증언 [별 볼일 있는 OTT]](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28156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