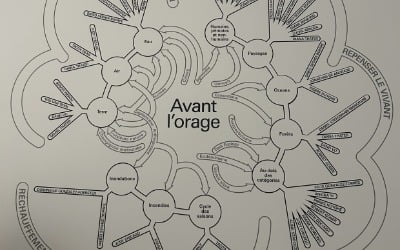동독 무너진 지 30년…아직도 멀고 먼 '통일 독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
동독: 서독의 발명품
4월 독일 논픽션 분야 1위
관료·법조·과학 등의 분야서
동독사람 비율은 1.7% 불과
동독: 서독의 발명품
4월 독일 논픽션 분야 1위
관료·법조·과학 등의 분야서
동독사람 비율은 1.7% 불과

베를린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독과 동독 사이에 존재하던 이념과 경제 시스템의 차이는 완전히 해소됐을까. ‘통일 후유증’이라고까지 이야기되던 서독 사람들과 동독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말끔하게 사라졌을까. 여전히 동 독 사람들의 소득이 서독 사람들보다 22% 낮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최근 독일에서 출간된 <동독: 서독의 발명품(Der Osten: Die westdeutsche Erfindung)>은 여러모로 논란에 휩싸일 만한 책이다. 4월 둘째주 슈피겔 논픽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 책은 통독 32년이 지난 지금, 서독 지역과 동독 지역 사이 갈등의 골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세계는 독일을 ‘하나의 독일’로 이해하지만, 정작 독일인은 동독과 서독 간의 차이를 당연하게 생각할뿐더러 서로를 향한 뿌리 깊은 편견마저 갖고 있다. 서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동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표준이 아닌 ‘비정상’이라고 여긴다. 독일에서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그리고 자연과학은 모두 서독 위주 관점이 지배하고 있다.
책은 서독이 마치 동독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서독의 동독을 향한 ‘타자화’가 독일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개한다. 동독 사람들의 구조적 빈곤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파헤친다.
저자인 디르크 오쉬만은 라이프치히대 독문과 교수로 2022년 2월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통일 후유증’ 논쟁에 불을 지폈다.
“1990년 이후 동독은 민주주의 발전에서 배제됐습니다. ‘공식적인’ 기회는 있지만 ‘실질적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권력, 경제력, 영향력의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시스템에 진입하거나 성공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일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계, 관료, 법조계, 언론계 그리고 주요 기업의 고위직에 있는 동독 사람 비율은 평균 1.7%에 불과합니다. 동독을 향한 불평등, 조직적 차별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며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는 방식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32년 전 독일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동독이 옛 연방공화국으로 편입된 것이었다고 분석한다. 통일 이후 기회를 얻은 쪽은 동독 젊은이들이 아니라 동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서독인 네트워크였다.


홍순철 BC에이전시 대표·북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