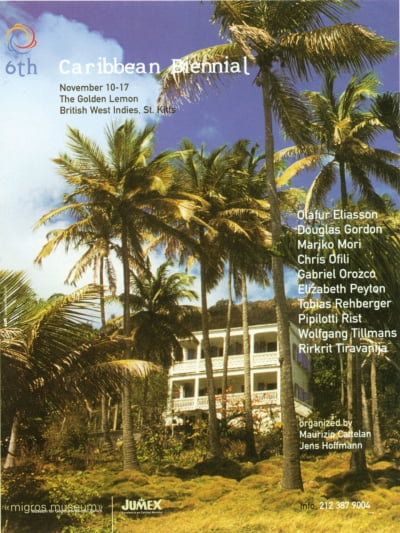"카텔란 작품 속 바나나 먹었다"…'셀프 제보' 대학생에 비난 봇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술계 "관심 받으려는 욕심에
4년 전 퍼포먼스 표절 후 자랑"
리움미술관도 '무대응' 일관
4년 전 퍼포먼스 표절 후 자랑"
리움미술관도 '무대응' 일관

미술을 담당하는 문화부 기자 상당수가 “서울대에서 미학을 전공하는 제 지인이 리움미술관에서 카텔란의 작품을 먹었다”는 ‘제보 메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 이유다. 이메일에는 20대 남성(노모씨)이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바나나를 떼서 먹고 껍질을 다시 붙여놓는 사진과 동영상이 담겨 있었다.
해당 전시는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카텔란의 개인전 ‘위(WE)’. 작품 제목은 ‘코미디언’이다. 바나나를 벽면에 테이프로 붙인 개념미술 작품인데, 2019년 아트페어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 작품은 12만달러라는 거액에 팔렸다. 예술품에 가격을 매겨 사고파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인지, 현대미술에서 작품과 작품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 여러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다.
작품이 더욱 유명해진 데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행위예술가 데이비드 다투나(48)가 “배가 고프다”며 벽에 붙은 바나나를 떼서 먹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게 한몫했다. 작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새 바나나를 붙였다고 한다. 실물 바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나를 테이프로 벽에 붙인 뒤 아트페어에서 팔았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개념미술 작품이라 가능했다.

이쯤 되면 새로운 의심이 고개를 든다. 설마 미학을 전공한 학생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미 있던 퍼포먼스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명품 브랜드의 넥타이를 차고, 관심을 갈구하는 것처럼 언론사에 연락을 돌린 것은 혹시 모두 의도된 행동이 아닐까. 모를 일이다. 그의 행동을 다룬 영자 기사가 해외 미술 뉴스레터에도 소개됐으니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