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땜질대책에…실수요자들 "자금계획 다 틀어졌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장에서
몇 번씩 바뀌는 대책으로 국민·시장 불신 커져
대출규제가 가수요 부추겨 부채 더 늘릴 수도
"가계빚 관리 필요하지만 정책 일관성 유지를"
빈난새 금융부 기자
몇 번씩 바뀌는 대책으로 국민·시장 불신 커져
대출규제가 가수요 부추겨 부채 더 늘릴 수도
"가계빚 관리 필요하지만 정책 일관성 유지를"
빈난새 금융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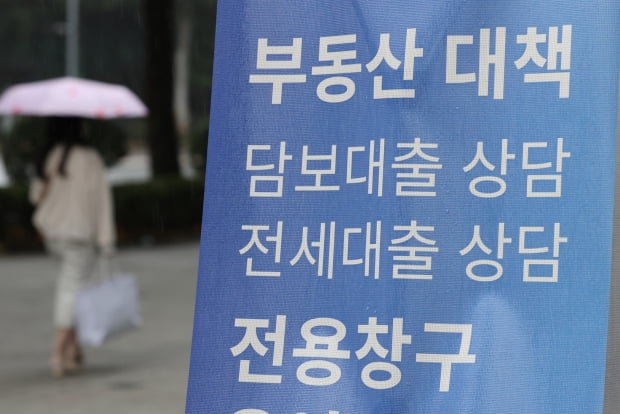
정부가 지난 26일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을 앞당겨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2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다.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에도 적용된다. 원래는 각각 내년 7월, 2023년 7월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확 앞당겨졌다. 지난 4월 정부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밝힌 지 단 6개월 만이다.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으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위기가 부채위기로부터 출발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지적이 아니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출받기가 쉬워지면서 대출이 일종의 ‘권리’처럼 여겨져온 게 사실”이라며 “고삐를 더 빨리 죄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다. 새 대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수요자들 사이에는 자금 계획이 틀어졌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넘쳐난다. 금융당국은 현 기준으로 새 규제의 영향을 받을 대출자가 전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지만 앞으로 새로 대출을 받을 수많은 실수요자까지 고려하면 이는 지나친 과소평가다. 내년에도 소득이 고만고만한 많은 사람은 DSR 규제에 막혀 대출 한도가 확 줄게 된다.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면 한도가 줄어드는 폭은 더 커진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어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규제가 1년에 몇 번씩 바뀌니 소비자의 정책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계부채를 밀어올린 근본 원인인 ‘집값 급등’은 여전하다 보니 대출 규제가 오히려 각종 가수요를 부채질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전세대출도 결국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어떻게든 대출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박씨처럼 갚을 수 있는 빚도 갖고 있겠다는 사람도 더 늘었다. 겹겹이 대출 규제에 '사다리 걷어차기'란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불요불급한 대출은 막고 실수요 대출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와도 상충한다.
일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내줄 때 은행이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라 대출자의 재산 상황과 소득 등을 더 엄격하게 확인하라고 했다. 담보만 보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데도 대출을 내주거나, 여윳돈이 있는데도 과도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럴 거면 수사권이라도 달라”고 볼멘소리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에 있는 예금같이 소비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은행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대로면 면담 과정조차 없는 비대면 대출은 아예 막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하면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87512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