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도드-프랭크법, 지방銀만 죽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현석 뉴욕 특파원
![[특파원 칼럼] 도드-프랭크법, 지방銀만 죽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2/07.18068892.1.jpg)
미국인들의 분노는 강력한 규제로 이어졌다. 그게 2010년 시행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이다. 이 법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대형 은행들의 손발을 옥죄는 규제로 점철됐다.
자산 5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해 매년 자산건전성 점검(스트레스 테스트)을 받도록 했다. 자기자본 투자를 틀어막았고 본업 외 다른 사업을 못하게 은행지주회사 감독도 강화했다.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고 은행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내줄 땐 대출상환능력을 샅샅이 확인하도록 했다.
대형 은행 도운 '분노의 규제'
규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노스다코타주에서 14개 지점을 운영하는 지방은행 코너스톤은행은 주력이던 모기지 사업에서 손을 뗐다. 모기지 신청자의 인종과 교육 수준, 소득 등 수많은 데이터를 매년 제출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해 수십만달러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일부 큰 지방은행은 자산 500억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영업을 줄이고 지주회사를 해체하는 식으로 은행을 쪼개기도 했다.
그 결과 대형 은행의 지배력은 더 커졌다. 미국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3대 은행의 수신잔액은 지난해 3조8000억달러로 지난 10년간 2조4000억달러 증가했다. 2007년 이들 3대 은행의 수신액 비중은 전체의 20%였지만 지금은 32%에 달한다.
모기지 시장은 웰스파고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들의 독무대가 됐다. 대형 은행 웰스파고는 모기지에 집중해 점유율 13%를 차지했고 은행권 규제 속에 비은행 모기지 업체인 퀴큰론은 1위로 부상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드-프랭크법으로 6000여 개 지방은행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엄청난 규제 비용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대형 은행들은 성장한 것이다. 과다한 규제는 이처럼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 벽에 막힌 중소·신규기업
이달 초 미국 남동부의 지방은행 BB&T와 선트러스트는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말이면 자산 4420억달러의 미국 6위 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기 이후 첫 대형 지방은행 간 합병이다. 지난해 도드-프랭크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합병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도 자산 2500억달러 이상으로 줄었다. 각각의 자산 규모가 2500억달러에 육박하는 BB&T와 선트러스트는 좀 더 커지면 규제를 받게 될 처지였다. 이에 아예 합병해 3대 대형 은행에 도전하기로 했다.
한국의 규제 수위는 세계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34개국 중 낙태와 매춘, 사촌 간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대마초 등을 모두 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규제 그물이 촘촘한데도 여전히 별별 규제가 추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뿐만이 아니다. 카페에선 1회용품 사용을 막는다며 ‘머그잔 사용’ 규제가 도입됐고 인터넷에선 ‘https(보안접속프로토콜) 사이트 차단’ 검열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 외모 지침 가이드라인까지 방송사 등에 내려보냈다.
사회 곳곳에서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존 강자만 좋아진다. 중소·신규 기업이 크지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realist@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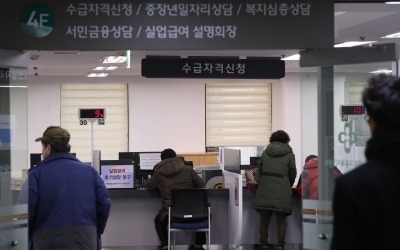
![[특파원 칼럼] 한국 떠나온 자율車 인재의 苦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2/07.18126601.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