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실 고려 없이 졸속 통과
수출·성장 이끈 산업 붕괴 우려
약속 이행 책임은 다음 정부 몫
'시한폭탄' 떠넘기기 너무 많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다. 불과 12년 동안 온 나라가 내뿜는 온실가스를 3분의 1 넘게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단순히 국내 법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NDC라고도 불리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에 의거해 한국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국제적으로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다.
즉 올해 10월 말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 목표가 제출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2024년 무렵부터 2년에 한 번 감축 목표의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 엄중한 약속을 담은 법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는 데 언론의 역량이 집중된 사이 제정되고 말았다.
첫머리의 글은 2035년께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 남쪽의 한 도시를 염두에 두고 쓴 가상의 상황이다. 등단과 함께 미국 문학의 희망으로 떠오른 필립 마이어의 2009년 데뷔작 《아메리칸 러스트》의 한 부분을 차용했다. 《아메리칸 러스트》는 미국 제조업의 몰락과 더불어 황폐화된 펜실베이니아의 가상 마을을 배경으로, 제조업의 쇠퇴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여파를 개인적 사건에 겹쳐 풀어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한국의 수출과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엄청난 화석에너지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NDC를 이행하자면 철강을 위시한 1차금속산업, 시멘트를 비롯한 비금속산업, 정유 및 석유화학과 플라스틱 등 관련 산업 대부분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다.
게다가 다른 대부분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이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거나 정체 상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배출량에서 세계 8위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한국의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중국, 미국, 인도 등의 배출량이 원체 많기 때문이다.
배출량 증가 추세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이 가난해질 게 뻔한 길을 걸어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추세를 바꿀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과도한 목표 설정의 책임이 이 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법을 제정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 전망치에 비해 30% 줄이겠다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물론 이 내용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정부가 이보다 완화된 목표를 제시할 때마다 국내외적으로 비난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해에 박근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줄이는 것이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달성 시기를 10년 연장하면서도 감축 목표는 7%포인트만 늘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앞선 목표라 판단됐기에, 문재인 정부도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고 기준점만 바꾸고 배출량은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작년 유엔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목표는 상향 조정됐고 엄청난 부담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
결국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약속의 이행 책임은 다음 정부부터 지게 된다. 국가채무 등 이렇게 떠넘기는 시한폭탄이 한두 개가 아니다. 감당해야 하는 국민이 바짝 정신 차리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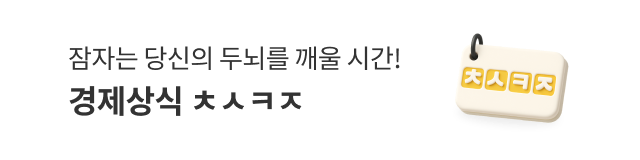
![[경제포커스] 기준금리 예측을 위해 필요한 생각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7.27048571.3.jpg)
![[경제포커스] 정치꾼의 미래 vs 기업가의 미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7.23249439.3.jpg)
![[경제포커스] 아무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7.2074281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