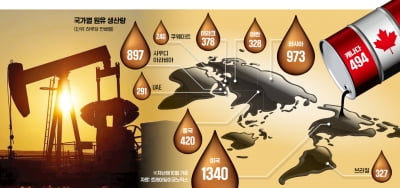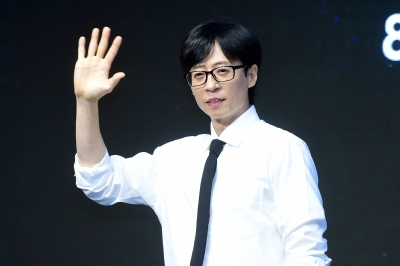2차 세계대전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핀란드는 러시아에 맞서 전쟁을 치른 몇 안 되는 국가다. 1939년 11월부터 105일간 치러진 ‘겨울전쟁’이다. 핀란드 주변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병합한 옛 소련은 핀란드 역시 손쉽게 복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1939년 11월 대대적 공습에 나섰다. 당시 핀란드 보유 전차는 33대, 소련은 641대, 항공기는 110대 vs 3380대 등 도저히 극복 불가능한 전력차였다. 누가 봐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은 전쟁이었다.
핀란드 지켜낸 겨울전쟁 데자뷔
하지만 해를 넘긴 전쟁 결과는 사실상 소련의 패배로 끝났다. 압도적 전력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국민의 완강한 저항과 겨울 추위에 고전한 소련은 핀란드의 다섯 배에 달하는 1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평화협정 끝에 핀란드는 비푸리 등 국토의 11%를 내줘야 했지만 소련의 병합을 피해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핀·소 간 겨울전쟁은 초강대국으로부터 약소국이 거둔 전략적 승리로 평가받는다.당시 소련은 겨울전쟁 후폭풍에 국제연맹에서 퇴출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이뿐만 아니라 1년 반 뒤엔 소련의 전투력을 얕잡아 본 독일 나치가 동부전선에서 대대적 침공을 감행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겨울전쟁이 2차 세계대전 최장·최악의 전투로 약 400만 명의 사상자를 낳은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 공방전의 씨앗이 된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겨울전쟁 데자뷔로 다가오는 이유는 패권국가의 잘못된 전철을 반복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21세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러시아 탱크를 화염병으로 맞서는 키예프 시민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초현실적 저항 의지 때문이다.
자유세계 의지 오판한 패권전쟁
화염병의 어원인 ‘몰로토프 칵테일’이 겨울전쟁에서 유래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겨울전쟁 당시 헬싱키에 소이폭탄을 퍼붓던 소련 외무상 바체슬라프 몰로토프가 국제 여론을 의식해 “폭탄이 아니라 기아에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빵 바구니를 보낸 것”라고 주장하자 핀란드인들은 화염병을 소련 탱크에 던지며 “이건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응수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몰로토프 칵테일이 80여 년이 지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재현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히틀러식 ‘전격전’(블리츠크리그)을 앞세워 수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예상은 이미 오판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뿐 아니라 전 지구적 반발 수위는 푸틴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외교뿐 아니라 문화·예술·스포츠계 등 전 분야에서 유례없는 강도로 자유세계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 제2의 차르를 꿈꿨던 푸틴으로선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20세기형 패권적 자만심이 빚은 21세기의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극은 되풀이된다”는 아널드 토인비의 지적은 지금과 같은 격변의 시기에 다시 새겨볼 통찰이 아닐까 싶다.


![[데스크 칼럼] 건설재해 해법은 '스마트 건축'](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18256415.3.jpg)
![[데스크 칼럼] 부메랑 될 中의 '제로 코로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15110652.3.jpg)
![[데스크 칼럼] 대선 이후가 더 걱정인 기업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7.2016637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