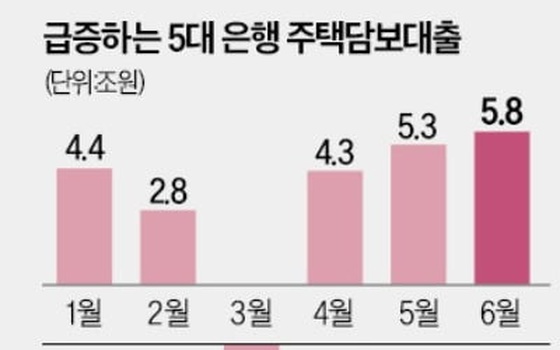[사설] "은행 돈잔치 안 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런 지적까지 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런 상황에서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5조8500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4분기에 희망퇴직금으로만 수천억원씩을 썼다. 법정 퇴직금 외에 1인당 ‘희망퇴직금’이란 명목으로 3억~4억원을 더 줬다. 연초 ‘퇴직금 잔치 열차’에 못 오른 은행원들이 재차 주어진 기회에 안도했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은행 이익은 어떻게 생겨났나. 금융혁신의 결과가 아니다. 금리상승기에 편승한 예대마진 확대, 즉 ‘고금리 장사’로 얻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은행 수익의 기본인 예대마진은 수급 논리로 정해진다고 하겠지만, 과도하다. 은행 스스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취약계층도 염두에 두면서 과도한 마진을 자율 조정하고, 내부에서의 이익 나눠먹기는 지양했어야 했다. 외부 간섭을 은행이 자초한 셈이다.
은행 경영에 상시 개입해왔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이 적지 않다. 오른 대출금리도 실제로는 정부의 묵인 혹은 승인 결과 아닌가. 감독당국은 예금금리에까지 시시콜콜 관여해왔다. 관치를 불러들인 은행 쪽 문제가 적지 않지만, 정부의 노골적 간섭과 개입도 문제다. 선진금융은 아직도 요원하다.


![S&P·나스닥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4%·테슬라 6%대 상승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01.372384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