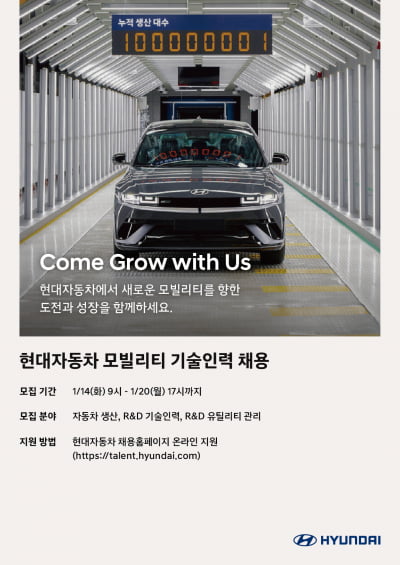1989년 첫 시행…換亂후 자율화
노무현정부 때 부활했지만 '역풍'

미분양 물량도 크게 늘었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13만 가구를 넘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면서 상한제 적용 단지는 ‘로또 아파트’가 됐다.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2013년 10월 3.3㎡(평)당 3200만원에 분양됐다.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격이 10억~11억원 선이었다. 지난달 이 주택형은 25억원에 실거래됐다. 6년 만에 분양가 대비 2.5배가량 뛰었다. 시세 차익만 15억원에 달한다. 서초동 래미안에스티지,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등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대부분 분양가 대비 아파트값이 배가량 뛰었다.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일부 요건을 완화했으나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2014년 이후 없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