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기준 없는 것은 위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재, 7대2로 헌법불합치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 침해"
내년 말까지 규정 바꿔야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 침해"
내년 말까지 규정 바꿔야

13일 헌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쓰는 확성장치의 소음 관련 규제 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79조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강모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로 소음을 유발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 사용 시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숫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과 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선거 소음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등하교·출퇴근 시간 전후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헌재는 2008년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데다 선거소음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며 12년 전 결정을 뒤집었다. 헌재는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리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두기로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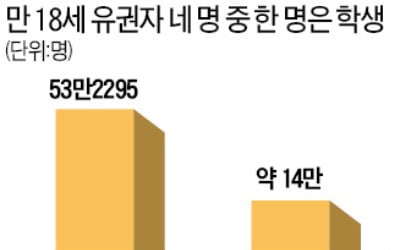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