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문서 위조해 '등본 세탁'
알고보니 은행 1.4억 대출 있어
대법 "근저당권, 은행이 우선"
소유권 날려 당장 짐 싸야할 판
한국은 등기 공신력 인정 안 해
법조계 "제도 바꿔 피해 막아야"
빌라에 대출이 껴있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장씨 부부는 분명 빌라를 구매할 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이전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은 다 갚은 것으로 돼 있었고, 빌라에 그 어떤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았다.

전 주인이 은행 인감 위조
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장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김씨의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라고 판결했다. 은행을 채권자로 다시 등록하라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 3심까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알고 보니 장씨 부부가 확인한 등본은 위조된 서류를 법원이 그대로 반영한 ‘부실 등기’였다. 이전 집주인 김모씨는 장씨 부부에게 집을 팔기 전 해당 빌라를 담보로 1억428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갚은 것처럼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감쪽같이 세탁했다. 장씨는 “서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기부등본인데,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장씨 부부는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 빌라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권이 장씨의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김씨의 대출금 1억4000여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겼고, 집이 처분돼 나온 돈은 은행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장씨 부부는 당장 아이 셋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공신력 인정 안 되는 한국 등기부등본
재판에서 장씨 부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는 “법적으로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등기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를 모른 채 거래했다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등기처럼 간주해준다는 것”이라며 “국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김상철 판사 등은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 제도 아래에서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뒤늦게 나타난 권리자로 인해 부실 등기의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도는 한국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며 실제 권리관계와 토지장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복 직후 국회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결론 냈다. 국내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 하나지만, 모르는 일반인이 대다수다.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해외 국가는 19개국이다. 독일은 민법(BGB) 제892조와 제893조, 대만은 토지법 제43조를 통해 등기부 공신력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도 ‘토렌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부실 등기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돼 있다.
임 변호사는 “거래자는 근저당권 등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등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등기공무원이 실질 심사권을 갖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서울 아파트 경매 빙하기…낙찰률 17.8% '역대 최저'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99.2034075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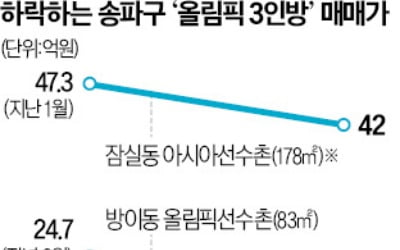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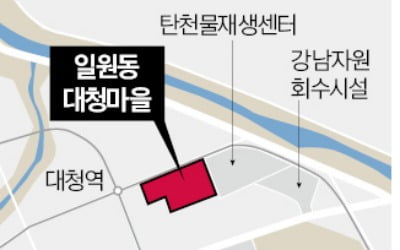



![[단독] "한국이 드디어"…한화오션 등 '1조4000억' 잭팟](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90554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