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 스러져가는 것, 광저우(广州) - 우동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
떠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성이 떠나자고 속삭인다면, 그것은 본능이 떠나자고 할 때를 놓친 것이다. 이미 늦었지만, 떠나야만 했다. 이 세계에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극작가이자 연극 이론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연극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상은 온통 연극이다.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쓰고 연극을 하고 있다. 결국 떠나고야 말았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비싼 비행기 삯을 치루고 간 곳은 광저우(廣州)였다. 아무도 여행가지 않는 그 곳.
갑자기 떠났던 그곳은 머물기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이방인으로 존재할 것 만 같았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국인’일 것만 같았다. 머문자리가 없다면, 세상은 공허로 흠뻑 젖어버린다. 공허 속에서 페르소나를 벗고 맨 얼굴로 세상을 바라본다. 애꿎은 얼굴은 거울처럼 비친다.

#2 회색빛으로 가득한
3시간 30분. 광저우를 갈 때에는 반드시 광저우 바이윈공항(白雲機場)행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다. 광저우를 들르는 김에 홍콩도 들러볼 얄팍한 전략을 갖고 있다면, 내려 놓아야 한다.
광저우행 항공기와 홍콩(Hong Kong)행 항공기는 항로가 다르다. 광저우행 항공편은 중국의 영공을 날아서 간다. 반면 홍콩행 항공기는 서울에서 제주를 거쳐 대만을 거치고 홍콩에 도착한다. 대륙은 특유의 흐릿하고 분명함이 있다. 광저우를 가는 여정은 대륙을 밟고 가야만 한다.
당연했다. 5만원 더 비싼 광저우행 항공기를 타고 갔다. 서울을 떠나 상하이를 통해 대륙에 발을 걸치면, 2시간가량 대륙을 관찰 할 수 있다. 수없이 늘어진 산맥과 평야. 가지처럼 돋아난 도로들. 경쟁적으로 우뚝 선 아파트와 빌딩들. 황색 강과 호수들.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희뿌연 스모그.
대륙은 스모그에 둘러 싸여있었다.
” 스모그는 대기속의 오염물질이 모여 만들어진 안개모양의 기체인데, 환경오염의 징표로 서울에도 스모그가 가득하지요. 스모그속의 서울은 베일에 싸인것 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경제발전의 상처랍니다.”
남향하는 비행기를 타면서 창밖에 보이는 중국의 도시들을 하염없이 보았다. 회색 빛이다. 가려진 대륙의 빛은 환상으로만 보였다. 현실이 빚어내는 환상은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쯤 위치했다.
지아장커(賈樟柯)의 영화 <임소요>(任逍遙) 속에서 보았던 불투명함. 영화를 가득 채웠던 스모그와 철거로 잔해만 남았던 회색 건물들. 비행기에서 바라본 중국의 회색 빛은 그랬다. 회색 빛의 시각적 관념은 많은 것을 기억 속에 남기고 말 것이다. 스모그를 걷고 나면 맨얼굴이 보이겠지만, 스모그는 빛깔을 왜곡시켜버리고 흑막에 싸인 도시를 만들어 버렸다.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만 했다. 언젠가는 발전이 저 스모그를 걷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약 100년전 런던을 감쌌던 스모그가 그랬듯이, 대륙을 감싸고 있는 스모그 역시 순간의 빛깔로 남을 것이다.

#3 밤에 먹는 점심(點心) 예차, 그 미쟝센(mise-en-scène)
‘점심’(點心)을 저녁 늦게 먹었다. 비행기가 밤에 도착한 탓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딤섬은 點心을 광둥(廣東)어로 발음한 기표다. 딤섬은 홍콩을 대표한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딤섬은 광둥을 대표한다가 올바르다.
저녁에 먹는 딤섬을 ‘예차’(夜茶)라고 한다. 밤에 차를 마신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 밤의 점심 예차는 ‘먹는다’는 단편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체험이다. 네온싸인으로 얼룩덜룩한 광저우의 밤,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경적소리가 도시를 감싸고, 예차를 먹는 주가(酒家)는 수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끌시끌하다. 금연이 안 되는 탓에 담배연기가 허공을 가르고, 딤섬을 익히기 위해 물에서 기화된 수증기 역시 허공을 가른다. 둘은 뒤섞여 하나의 ‘스모그’가 된다. 회색도시 광저우의 밤 역시 회색 빛이 만연했다. 주가 역시 스모그로 뒤덮였다. 딤섬을 먹는 순간, 공간, 청각, 후각, 미각을 회색 빛이 지배한다. 이는 예차를 ‘먹는다’가 아닌 예차를 ‘한다’는 고차원의 ‘체험’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이것은 광저우 그 자체다. 광저우가 가진 리듬이고, 미쟝센(mise-en-scène)이다.
시아쟈오(虾餃), 나이황바오(奶黄包), 창펀(肠粉)에 국화(菊花)차를 시켰다. 한국의 만두는 ‘만두’로 끝난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만두’라고 여기는 것은 세분화 된다. 피를 찐빵처럼 두껍게 하는 것을 바오즈(包子), 얇은 피로 만든 것은 지아오즈(餃子)라고 부른다.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빵 같은 것은 만터우(饅頭)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국에서 부르는 만두와 같은 한자를 쓴다. 중국과 한국에서 하나의 단어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다.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다. 문명의 문화적 구조는 상대적인데, 이는 각각 자신도 모르게 진리화되어 구조화 된다. 만두도 그런 것이 아닐까. 만두 구조주의 철학.
한국의 냉동만두를 생각했다. 얇은 만두피에 둘러 싸인 만두 속을 씹으면 감칠 하면서 맛있다. 그러나 시아자오, 나이황바오, 창펀을 먹노라면, 냉동만두에 질렸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번쩍 든다.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맛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냉동만두에 질려버린 탓도 있다. 냉동 만두에 질렸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현실과 거리두기에 성공한다. 거리두기는 광저우의 밤. 예차로 도배된 이순간을 미쟝센으로 보관한다. 예차는 프루스트(Proust) 현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먼 훗날 이곳을 다시 찾을 때에, 이 리듬과 미쟝센을 상기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셀의 마들렌처럼.
스모그로 가득한 주가에서 시아쟈오를 한입 베어 문다. 교자피(皮)속에 들어있던 통새우가 톡톡터지면서 치아를 통과하여 혀 위에 닿는다. 굴소스로 뒤범벅된 새우는 혀 위에서 타액과 섞여 굴소스라는 옷을 벗고, 1에서 1/2로, 1/4로 1/8로 조금씩 세분화되어 분쇄된다. 분쇄된 시아쟈오는 목젖을 거쳐 식도로 진입한다. 이제 새우의 운명은 여기까지다. 시아자오는 스모그처럼 불투명한 맛이지만, 혀와 연수는 만족한다. 그리고 찰나를 기억하는 혀끝은 언제라도 미쟝센을 재연하기 위하여 몇 섹터(sector)의 데이터를 기록한다.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르셀의 마들렌처럼.

#4 도시의 아침과 거리두기– 티엔허(天河)
동이 텄다. 호텔의 커튼을 젖히면 광저우의 아침이 보였다. 창문을 여니 경적소리가 들린다. 10초 간격으로, 끊이지 않고 들린다. DJ 쉐도우(DJ Shadow)의 음악처럼, 경적소리는 하나의 샘플(sample)로 도시 위를 둥둥 떠다닌다. 그러나 그 음은 명확하지 않았다. 스모그에 묻힌 탓인지.
이곳에 짐을 풀어버린 것은 어쩌면 경적소리 때문일지도 모른다. 도시를 감싼 흩뿌연 스모그와 이 경적소리가 이상하게 그리웠던 것이다.
호텔이 위치한 곳은 광저우의 강남(江南)이라 할 수 있는 티엔허(天河). 집값도 1등. 물가도 1등. 교통난도 1등. 유동인구도 1등. 광저우에서 가장높다는 중신광장(中信廣場)도 여기에 있다.
아침 8시. 호텔에서 내려와 광저우 지하철 티위중신(体育中心)역에 가보았다. 이곳에도 ‘지옥철’이 있었다. 새까만 정장에, 넥타이. 한 손엔 스마트폰을, 한 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서 똑같이 생긴 얼굴과 똑같은 자세로 지하철에 돌진하는 사람들. 그들은 압제된 고통을 감내하기 위하여, 강한 성조가 섞인 중국어로 독백하며 한숨을 쉰다. 몸을 부대끼고 지하철을 타지만, 그들의 좁혀진 거리만큼 그들은 가깝지 않다. 도시속의 고독은 지하철에 가득했다.그들은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마이당라오(맥도널드, 麦当劳)나 컨더지(KFC,肯德基)에 들러 머핀이나 페스트리를 우걱우걱 넘긴다. 맛을 아는지 모르는지, 쓰디쓴 커피와 먹어 넘기는 그 표정은 자못 ‘쓰’다. 맛이 쓴 것인지, 광저우의 아침이 쓴 것인지. 그들의 삶이 쓴 것인지.
닮았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광저우를 감싼 스모그 속 경적소리와 지하철의 사람들. 흩뿌연 모습들로 기억에서 사라진 그들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었다. 일상에서 그 무리에 속할 때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잊어 버리고 만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상을 관찰 했을 때, 일상은 참으로 덧없다.
도시의 회색 빛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상기한다. 티엔허의 회색 빛. 그것은 나를 규정하는 색이었다.

#5 짙어진 스모그와 오래된 거리 – 샹시아지우(上下九)
샹시아지우(上下九)의 오후는 뿌옇고 따사로웠다. 쏘아대는 햇볕은 구름과 스모그에 가려서 정말로 내리쬐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피부는 햇볕에 반응했다. 다른 곳보다 유독 이곳에 올 때만 피부는 다르게 반응했다.
베이징루(北京路)와 함께 광저우 최대의 번화가인 샹시아지우는 무채색으로 가득한 데생(dessin) 같았다. 거리는 건물을 수놓은 알록달록한 간판과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100년이 넘은 민국(民國)시절의 건물들과, 골목골목 밀집된 집단거주지들. 약재로 가득했던 시장. 허리가 반쯤 휘어있는 노인들이 스모그 속에서 혼재해있는 그 모습은 무채색 데생이었다.
샹시아지우의 매력은 무채색에 있다. 그 무채색은 문명의 진보와 변화, 전통의 고수 사이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샹시아지우 골목 구석 붉은색 벽돌의 집단 거주지는 스러져가고 있었다. 스러져가는 건물에는 “无限信仰毛主席” – 마오주석을 무한대로 신뢰하자. “先破後立” –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자 등의 문화대혁명 시절의 구호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집단 거주지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집단거주지 어귀에서 담배를 피워 날리던 노인(老人). 그 노인의 머리 위에는 공산당의 모자가 있었다. 붉은색 별이 크게 ‘오바로크’된 국방색모자는 그 노인의 청춘이었는지도 모른다. 모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쓴다지만, 노인은 어쩌면 스러져가고 있는 자신의 청춘과 침잠하고 있는 옛 광저우를 자신의 머리 위에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집단거주지가 스러지고 만다면, 붉은별 공산당 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노인과 집단 거주지의 운명이 광저우의 스모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이여 조국이여! 나의 죽음은 그대 때문이다. 그대 어서 부자가 되어라! 강해져라! – 위따푸(郁達夫)저, 타락 중에서

5분을 걸어 스러져가고 있는 골목을 돌아보니 모든 것은 스모그에 가려져 불투명했다. 이곳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스러져가는 옛 광저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회색 빛 동네의 ‘풍크툼’을 느꼈다. 지금은 재개발로 동네 전체가 철거되어 옛모습을 볼 수 없는 그 곳. 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 그곳 역시 지금의 샹시아지우의 골목 속 집단거주지처럼 개발의 논리 앞에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 갔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회색 빛. 그 기억의 산물을 샹시아지우의 뒷골목이 소환했다.
골목을 떠나 샹시아지우의 주로로 나왔다. 솽피나이(雙皮奶)라고 부르는 광둥식 우유푸딩을 먹기위해 런신(仁信)이라는 디저트 가게에 갔다. 벽과 바닥에 붙은 타일들과 그을림. 그와 어울리지 않는 원목 테이블. 세련되고 도회적인 인테리어들을 가볍게 무시하는 이 불협화음속에서 샹시아지우를 보았다. 솽피나이를 한 술 떠봤다. 응고된 우유는 탄성 없이 숟가락 위에 놓여있었다.
푸딩과 솽피나이는 같은 계통의 후식이다. 그러나 솽피나이를 감싸고 있던 백색 사기 그릇과, 조악한 인테리어의 가게, 그 속에서 홀로 습진 그늘을 등진 나. 솽피나이는 근본적으로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서양식 푸딩과는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음식은 미각을 만족시키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시공간에 따라서 먹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솽피나이는 광저우를 머금고 있었다.
혀를 감싸는 우유의 진한 내음과 달콤함. 세상에 단 것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솽피나이처럼 단 것은 많지 않다. 그 달콤함은 우유 특유의 비릿함 때문이 아닐까. 솽피나이의 달콤함이 탑노트(Top Note)라면 우유의 깊고 진한 향은 미들노트(Middle Note)와 라스트노트(Last Note)쯤 되겠다. 향수에 탑노트만 존재한다면 그건 방향제에 그쳤을 것이다. 솽피나이도 달콤함만 있었다면 설탕이나 물엿에 불구하지 않았을까.
광저우의 스모그를 생각한다. 안개처럼 핀 스모그는 광저우의 미들노트나 라스트노트가 아닐까.
광저우에 스모그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자욱함이 사라진 과도기란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않았을까. 향은 언젠가 날아가 버리고 만다. 광저우의 탑노트도 미들노트도 라스트노트도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리라.

#6 개, 중국인 출입금지 – 샤미엔다오(沙面島)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상하이,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의 문을 외국인에게 활짝 열었다. 5개의 도시에는 서부열강들의 조계지가 형성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 될 때까지 조계지는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샤미엔다오는 광저우의 조계지였다. 이곳에는 150여개의 서양식 건축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포루투갈등이 조계지를 점령한 탓에, 이곳은 유럽에서도 볼수 없는 ‘만국건축박람회’를 시전 하고 있다.
샤미엔다오와 육지사이로 5미터 가량의 폭으로 주강이 흐른다. 지금은 주강의 폭이 넓게만 보이지는 않지만, 조계지였던 시절의 샤미엔다오는 지금보다 폭이 더 넓게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는 ‘잡상인 출입금지’ 차원의 명령이 아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는 샤미엔다오를 감사고 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
이건 명령이라기 보다는 샤미엔다오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의 암묵적인 합의였다. 물지도 짖지도 않는 중국인은 짐승취급을 당했다. 레비-스트로스는 원시부족이 야만하고 미개하다는 취급을 받는 것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하려 했다. 다른 집단의 문화방식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인식으로 편견을 버리라는 것이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이다. 영국인과 프랑스인에게 중국인은 원시부족으로 여겨졌다. 그들의 우월감이 오히려 야만적이라는 모순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문화- 상대주의 없는 교역은 보이지 않는 지배와 피지배를 낳고 말았다.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
샤미엔다오는 이제 웨딩촬영과 데이트코스로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었다. 조계지 당시 하나뿐이었던 다리는 4개로 늘어났고, 근방에는 지하철 역까지 생겼다. 샤미엔다오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이곳을 기념한다.
샤미엔다오에 수놓인 가로수 그늘을 벗삼아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40년 샤미엔다오 주민을 만났다. 거주민과 대화를 나누다가 샤미엔따오의 소변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사람이 여기는 무슨일로 오는겨? 볼것도 없는디. 그거 아누? 샤미엔다오 구석을 들어가보면 소변냄새가 난다네. 왜 그런지 아누? 그건 여기 주민들이 공중도덕이 없어서 여기저기 소변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네. 중국인이 오래 전 이곳에서 받았던 설움을 토해내는 것이네. 우리 중국인은 설움을 절대 잊지 않는다네.”
거주민의 말이 루쉰(魯迅)이 <아Q정전>을 통하여 비판했던 중국인 특유의 ‘정신승리’인지, 중국인의 울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샤미엔다오가 화려한 서양의 건축물 뒤에 감추어진 중국인의 설움이 묻어있다는 사실이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황샤(黃沙)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리를 건너 육지로 돌아갔다. 지하철역으로 가면 갈수록 샤미엔다오는 스모그에 가려져 희미해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샤미엔다오를 둘러싼 스모그가 더 이상 조계지와 중국인을 가르는 경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몬드리안 같은 추상 – 베이징루(北京路)
몬드리안의 그림을 생각했다. 베이징루는 몬드리안 그림 같다. 촘촘하고 명료하지만 손에 잡히지않는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도로가 그물처럼 얽혀 나열되어있고, 원색들이 도로 안을 가득 채워 명료하다. 그러나 그 합은 추상적이어서 흐릿한 느낌만 줄 뿐이다.
베이징루(北京路)역 B번출구로 나서면 세상은 색 투성이다. 초입에 서있는 중국식 패스트푸드 쩐쿵푸(眞工夫)간판으로부터 몬드리안의 그림은 시작된다. 그 직선의 길 위로 펼쳐진 색의 조화은 자칫 어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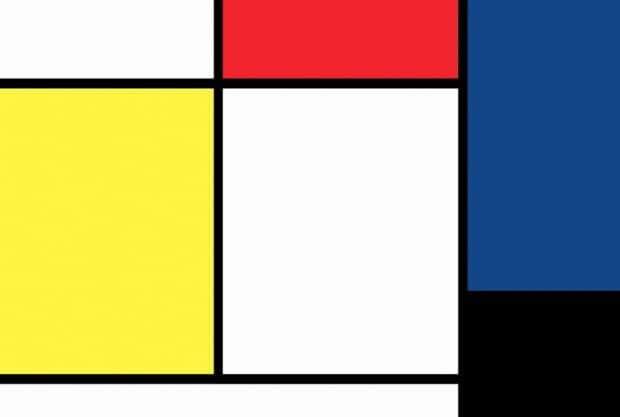
베이징루는 주강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광둥성 인민정부까지 2km가량 펼쳐져 있는 길이다. 시작지점 좌우로 물이 흐르고, 남북으로 인간이 흐른다. 둘이 그려놓은 십자는 이곳을 광저우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다. 송나라때부터 번성한 곳이라고 하지만, 이곳이 중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신해혁명 이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근대부터 십자가가 그어지면서 중심이 되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베이징루는 각각의 원색으로 도배되어 있다. 초입 우측에 위치한 티엔허백화점(天河百貨)과 광바이백화점(广百)은 파란색, 신화(神話)서점은 노란색 빛을 띈다. 가운데 위치한 빨간색은 광둥성 인민정부 청사이다. 나머지를 검정색이 빈틈을 메우는데, 이는 빈민들이 사는 집단거주 지역이다. 샹시아지우처럼 이곳에도 집단 거주지가 있다. 이곳의 집단 거주지 역시 철거 중이거나 철거가 예정되어 시한부 목숨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철거가 마무리 된 곳은 몬드리안 그림의 백색 공간처럼 공(空)터가 된다. 공터가 된 공간을 다른 원색들이 채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베이징루는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추상적이지 않은 화려하고 명료한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몬드리안의 그림이 3원색과 검정색 공(空)간의 조합으로 명료하고도 추상적인 ‘스모그’를 연출했듯이, 그 조합만이 가지는 그림이 있다. 공간에 다른 원색에 더해진다면 화려해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베이징루를 대표하는 추상미(美)는 떨어지게 된다.
너는 점점 사라지지만, 나에게는 찬란한 삶을 주었다. – 지아장커( 賈樟柯) 감독, <24시티> 중에서

서울의 청진동을 생각한다. 피맛골을 지워버린 그곳은 화려하고 명료해졌지만, 추상적 그림이 주는 환상은 사라졌다. 현상이 환상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세상에 현상만이 가득하다면 예술의 의미도 줄어들 것이다.

#7 빛과 빛. 야경 속의 스모그 – 주강(珠江)
발전된 도시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뉴욕, 런던, 파리, 홍콩은 빛으로 가득 차있다. 그 도시들은 빛이 상품이 되고, 빛이 상징이 됐다. 빛은 희망과 동의어이고, 화려함과도 동의어로 통했다. 그래서 번영한 도시에는 빛이 가득하다.
광저우도 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 노란빛, 파란빛, 빨간빛, 초록빛, 황금빛이 도시 곳곳에 가득하다. 특히 빛이 만발하는 곳은 강이다. 강물위로 빛을 반사하여 두 배로 뽐내기 때문이다.
베이징루(北京路)에서 걸어서 15분. 걷다보면 많은 빛들을 만나지만, 주강에서 만나는 빛은 남다르다. 특히 유람선을 타면, 유람선이 빛을 유영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참 명료한 빛이다. 베이징루에 남아있던 희미한 스모그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곳이 광저우인지, 홍콩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광저우의 맨얼굴을 보기 원했다. 그래서 광둥타워(廣東塔)로 향했다. 광둥타워에 올라 주강의 야경을 바라보면, 야경 속의 스모그를 볼 수 있다. 주강신청(珠江新城)부터 저멀리 광저우 서쪽의 리완구(荔灣區)까지 시야가 펼쳐졌다. 화려한 빛들은 스모그에 가려졌다. 결국, 명료하지 않은 불투명한 형형색색의 빛이 광저우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근거리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흐림은 높이 올랐을 때 분명해졌다. 명료하지 않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으로 다가왔다.
아름다운 것이 항상 매력적이지는 않다. 아름다운 것보다 순간에만 머무르는 무언가가 더 매력있다. 지는 꽃은 순간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광저우의 스모그는 순간의 미(美)다.
광저우의 스모그도 언젠가는 발전 속에서 없어지리라. 과도기의 매력이 여기 있다.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과도기 이듯이. 그래서 소중하듯이, 말이다.
글, 사진 – 우동섭(xyu2000@naver.com)
“étranger : 이방인”
“étranger : 이방인”은 한국경제신문 HK 여행작가 아카데미(cafe.naver.com/hktouracdemy) 사람들이 펼치는 ‘여행 꿰뚫어보기’를 실천하고 나눔하기위해 탄생했습니다. 한경닷컴 스내커를 통하여 다양한 이방인의 시학의 이야기가 주 1회 펼쳐집니다. 이방인에 귀 기울여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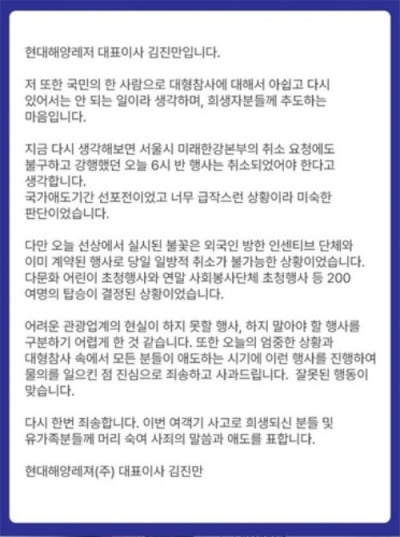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