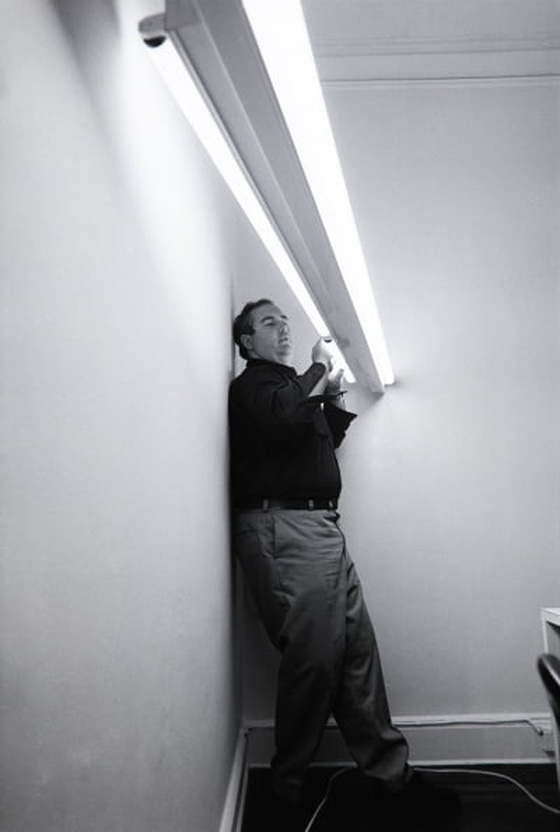[김영헌의 마중물] 세종대왕이 그립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헌의 마중물] 세종대왕이 그립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Q.25808613.1.jpg)
사람들은 “왜 태종이 세자였던 양녕을 폐위하고 충녕을 세자로 삼았는지”관심이 많은 것 같다. <세자 이제를 페하여 광주(廣州)로 추방하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았다. 임금이 “백관들의 소장을 읽어보니 몸이 송연(竦然)했다. 이것이 천명을 이미 떠나버린 것이므로 이를 따르겠다.”했다.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무릇 사람이 허물을 고치기 어렵다>(태종실록 발췌) 태종이 양녕을 세자에서 폐(廢)하는 말이다.
세종리더십 권위자인 박현모 교수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설파한다. “첫째는 인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절제력과 치우치지 않는 공적인 태도입니다. 셋째는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독자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는 태도입니다.”그러면서 태종이 충녕을 왕세자로 삼은 이유는 첫째, 학문, 둘째, 정치의 대체를 앎, 셋째 후계자(문종) 이라는 것이다. 태종은 충녕이 늘 학문을 가까이 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현자(賢者)로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듯하다.
신세돈 교수는 세종의 바른 정치 3대 기본원칙을 즉위교서에서 찿아낸다. 즉위교서에는 세종의 각오와 정신이 잘 들어있다. 첫째, 어진정치를 펴겠다(시인발정,施仁發政). 둘째,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민유방본,民維邦本). 셋째 바른 정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위정인최,僞政人最). 충녕은 별안간 세자가 되었고 세자가 된 지 한 달 만에 왕이 되었다(1418년 8월 10일). 충녕은 스스로 왕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우리는 어렵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종의 국가 철학과 리더십을 그리워한다. 정암 조광조,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도 세종처럼 정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조대왕도 정치의 롤 모델로 세종대왕을 삼았다. 그는 “세종대왕은 실로 우리 동방에 태평만세의 터전을 닦으신 임금입니다.”라 했다. 하지만 통치 스타일만은 좀 다르게 했다.
요즘 회사마다 다들 어렵다고들 한다. 이럴수록 문제 실마리를 가까운 데서 찾았으면 한다. 바로 <세종대왕 리더십> 이다. 세종대왕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지금의 회사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오늘따라 그분이 무척 그립다.
<경희대 겸임교수, 전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원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네이버웹툰, 나스닥 공모가 주당 21달러…희망가 상단 결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5900990.3.jpg)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美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A.37133868.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