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국과 일본…'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
입력
수정
지면A25
초이노믹스 '일본화' 예방적 처방
'프로보노 퍼블리코' 발휘해줘야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소프트 패치(일시적 경기둔화)’에 빠져 경착륙 논쟁이 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 여부와 관련해 중진국 함정 우려가 나올 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이럴 때 국민의 기대가 높은 경제팀의 출범은 일단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이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에 빗대어 벌써부터 초이노믹스 효과를 끌어내리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초이노믹스가 태동된 만큼 아베노믹스와 비교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간다. 거시경제 목표도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비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강도 있는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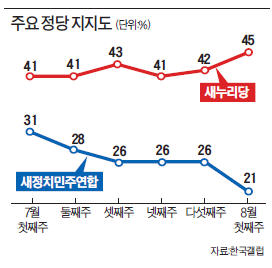
정책 여건과 동원된 정책 수단도 차이가 난다.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4%(국제통화기금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건전하다. 정책금리도 2.5%로 얼마든지 내릴 여지가 있다. 유동성 조절정책은 최소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경제정책 신호에 대한 정책 수용층의 반응도 일본처럼 좀비 국면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달 열리는 금융통화 회의에서 정책금리 인하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으나 이미 주어진 여건 아래 여지가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했다. 인위적으로 짜내는 비정상적 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상적인 대책인 만큼 비정상 정책의 태생적 한계인 후유증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아베노믹스는 비정상 대책의 표본이다. 국민소득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250%를 넘어 더 이상 재정정책을 동원할 수 없다. 정책금리도 제로(0) 수준이다. 유동성 조절정책은 함정에 빠진 지 오래됐다. 거듭된 정책 실수로 정책당국과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 수용층의 반응은 좀비 국면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동원하는 정책수단이 발권력에 의존하는 ‘충격요법’이다. 전시에 찍어낸 돈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강제 저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아베노믹스는 발권력으로 엔저를 유도해 인접국의 경쟁력을 빼앗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된다.
경기부양 중점 대상도 다르다. 초이노믹스는 한국 경기대책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 투자가 아니라 가계 소비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변경됐다. 단순히 소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데 초점을 뒀다. 아베노믹스는 소비에 중점을 뒀던 종전의 경기대책이 먹히지 않자 기업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되돌아왔다.효과 면에서 이 점은 큰 차이가 난다. 총수요 항목별 소득기여도를 보면 한국은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한다. 일본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같은 경기부양의 화살을 쏘면 한국은 7점까지 맞춰도 되나, 일본은 반드시 10점 만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크게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초이노믹스는 과도기에 있는 한국 경제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해외에서 기대가 높다. 이에 반해 아베노믹스는 벌써부터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그동안 한국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절실했던 ‘마라도나 효과(마라도나를 지나치게 의식한 수비수가 미리 행동하면 다른 쪽에 공간이 생겨 골 넣기가 쉽다는 의미)’를 갖춰 놓았다면 이제 우리 국민이 ‘프로보노 퍼블리코(공익을 위해)’ 정신을 발휘해 줘야 할 때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