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인공지능 번역
입력
수정
지면A35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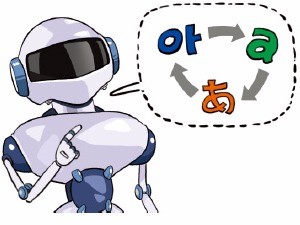
자동번역의 역사는 70년이 넘는다. 냉전시대 IBM이 러시아어의 영어 번역 기술을 개발한 게 1954년이다. 1980년대 ‘자연언어처리 기술’에 이어 2007년 등장한 구글의 ‘기계번역(PBMT) 기술’은 문장을 구문 단위로 끊어서 해석할 정도가 됐다. 물론 구 단위로 쪼개서 번역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맥락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았다.
획기적인 발전은 2015년 ‘인공신경망번역(NMT)’ 덕분에 이뤄졌다. 문장 전체를 통째로 번역할 수 있어 표현이 더 정확하면서도 자연스러워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네이버가 자사 번역기 ‘파파고’에 이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했다. 11월에는 구글도 가세했다. 고전 명작소설의 전문가 번역본보다 더 정확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물론 ‘사소한 부자연스러움’은 남았지만 대단한 발전이다.
여러 나라 언어를 입체적으로 번역하는 ‘다중언어모델’까지 나왔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언어 조합을 기계 스스로 맞춰내는 ‘제로샷 번역’이 가능해졌다. 일본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경험이 없는데도 인공지능이 일본어-중국어 번역을 순식간에 해내는 것이다. 그야말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이드 없이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
올해부터는 한문 고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가시화된다.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승정원일기》를 18년 만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2억4000만여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1994년 착수 이후 20%도 못한 작업이다. 전문 고전 번역자가 20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공신경망번역기는 가장 효과적인 조력자가 될 듯하다.
오는 21일에는 ‘알파고 바둑’처럼 인간과 번역기의 대결도 펼쳐진다. 출전자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출신 번역사와 구글·네이버 번역기. 세종사이버대와 국제통번역협회가 이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한다. 아직은 질적인 면에서 인간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속도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놀라운 진보다.
그래도 질문은 남는다. 대체 시는 어떻게 번역하지? 그 미묘한 뉘앙스와 달착지근하면서도 쌉싸름한 은유나 상징의 말맛을 기계가 얼마나 완전하게 옮길 수 있을지.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