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인공태양 개발 경쟁
입력
수정
지면A35
홍영식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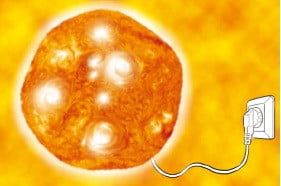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식의 인공태양을 발전시켜 밤에 거리 조명을 대체해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었다. 인공태양이 빛 공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낮 시간 연장이 동식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두 나라는 사업을 접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또 다른 방식의 인공태양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이 직후였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현상에 주목했다. 핵융합 방식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를 응용해 에너지를 얻는 기술이다. 태양 내부에선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낸다. 수소 1g이 핵융합하면 석유 8t을 동시에 태우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정도다. 핵융합 에너지는 원료인 수소를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도 발생하지 않아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의 최대 관건은 온도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초(超)고온 플라즈마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장비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로다.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려면 섭씨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세계 각국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학원 플라즈마물리연구소가 독자 핵융합 실험로 ‘이스트(EAST)’를 이용해 섭씨 1억 도의 초고온에 이르는 데 성공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얼마 동안 유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 온도를 10초 이상 유지한 나라는 없다. 일본이 1억 도까지 높인 적은 있지만 유지 시간은 2초에 불과했다.
한국은 199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폭 9m, 높이 6m, 무게 60t의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로(KSTAR)’ 설치 작업을 시작해 2007년 완공했다. KSTAR은 지난해 말 플라즈마 온도를 7000만 도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내년에 1억 도에 도달시켜 10초 동안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융합 실험이 성공해 인류에 무한대의 청정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게 된다면 탈(脫)원전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