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농민들 여전히 영세 소농…'경영형 부농'으로 자라지 못했다
입력
수정
지면A18
이영훈의 한국경제史 3000년
(27)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추억
北 역사학자들, 18~19세기
자본주의 발현 주장했지만 경영형 부농은 일부지역에 국한
대부분 영세 규모 소농에 그쳐
行商처럼 行工이 이동하면서 자본결합 아닌 계 조직 형태로
쟁기·가래·호미 등 주문 제작
20세기 초 외래자본 침투로 전통적 공업·상업 점차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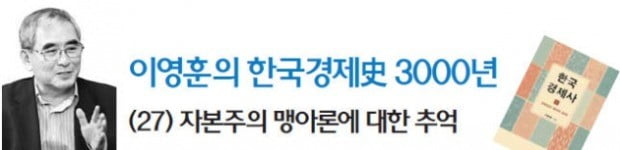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역사학은 18∼19세기 조선에서 달팽이걸음이나마 자본주의 싹이 텄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론’이다. 김일성이 맹아론을 처음 주장했다. 이후 맹아론은 북한에서 봇물이 터진 듯했다. 곧이어 남한의 역사학자들도 맹아론에 동조했다. 물론 김일성의 교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후 1980년대까지 맹아론은 남북한 역사학의 주류로서 맹위를 떨쳤다. 조선의 역사가 정체하지 않고 ‘세계사의 법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맹아론은 일제의 지배로 상처받은 민족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불행하게도 맹아는 충분히 자라기 전에 일제에 의해 꺾이고 말았다. 맹아론은 그렇게 우리 민족의 경제가 정체한 것은 실은 일제 지배 탓이라고 가르쳤다. 맹아론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적대 감정을 정당화했다. 1980년대 이후 맹아론에 실증과 이론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늘날 맹아론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는 역사학자는 드물다. 그럼에도 맹아론은 아련한 그리움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맹아론이 심어 놓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반일 민족주의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장밋빛 환상
남한에서 맹아론을 개척한 연구자는 김용섭(1931∼)이다. 1962년 그는 작은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 병작을 많이 얻어 2㏊ 이상의 대규모 농사를 상업적으로 경영하는 농민을 18세기 전라도 고부의 토지대장에서 발견했다. 그리고선 이들을 ‘경영형 부농(經營型 富農)’이라 이름했다. 16∼17세기 영국 농업에서는 지주의 땅을 빌리고 임노동을 고용해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요오맨(yeoman)’이라 불린 부농층이 성립했다. 요오맨은 영국 자본주의의 선구자였다. 김용섭이 그 요오맨을 조선에서 찾아내 경영형 부농으로 이름하자 역사학계는 오랫동안 흥분했다.
경영형 부농설에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 김용섭의 관찰 사례는 어느 한 장소의 어느 연도에 국한된 단면에 불과하다. 그 점에 착안해 필자는 어느 한 장소의 여러 해에 걸치는 장기 추세를 조사했다.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대략 20개 사례가 수집됐다. 그것들은 공통으로 1㏊ 내지 2㏊ 이상을 경작하는 대규모 농업이 장기에 걸쳐 쇠퇴하는 대신 1㏊ 또는 0.5㏊ 이하의 소농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이전 연재에서 소개한 대로 18∼19세기 조선의 농민은 영세 규모의 소농으로 표준화하는 길을 걸었다. 영국에서와 같은 자본-임노동의 관계로 분해하는 추세는 결코 아니었다. 조선의 농업에서 영국의 요오맨과 같은 부농이 성립해 농촌 경제를 자본주의로 인도했다는 경영형 부농설은 장밋빛 환상이었다.

자생으로 자본주의 길을 걸은 서유럽에서는 원래 농가의 가내 부업이거나 장원 영주가 경영한 공업이 시장생산의 농촌공업으로 발전했다. 생산 형태는 여전히 도구에 의존하는 수공업이었다. 산업혁명 이전의 초보적 공업화란 뜻에서 ‘프로토(proto) 공업화’로 불리기도 한다. 프로토 공업화의 주체는 상인이다. 상인들은 주변 농가에 원료와 도구를 대여해 직물을 짜게 하고 임료를 지급했다. 이른바 선대제(先貸制) 방식이다. 그렇게 상인이 주도한 선대제 농촌공업이 공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조선 농촌에서 그 같은 형태의 공업을 증명하지 못했다. 17∼18세기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런 형태의 농촌공업이 성립했다. 필자는 조선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서 많은 자료를 뒤졌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장이 닫힌 가운데 좁았고 기술 수준이 낙후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면방직공업이 선대제로 운영되면 면작(棉作), 방적(紡績), 직포(織布), 표백(漂白), 염색(染色) 등의 공정이 각각 시장생산의 공업으로 분리된다. 조선에서는 농업 면작과 방적 이하의 공정이 분리됐을 뿐이다. 방적 이하의 여러 공정은 하나의 가내공업으로 통합됐다. 제시된 그림은 18세기 김홍도의 풍속도다. 물레로 실을 잣고, 실에 풀을 먹이고, 베틀에서 포를 짜는 공정이 주부의 가내공업으로 영위되고 있다. 방적 장면을 자세히 살피면 손으로 물레를 돌리는 가운데 실을 잣는 방추가 하나뿐이다. 동시대 중국은 발로 물레를 돌리고 방추가 두셋이어서 그 생산성이 조선의 10배 이상이었다.
낮은 도시화율
18∼19세기 상인은 여러 장시를 이동하거나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행상(行商)이었다. 한곳에 정착해서는 생계소득을 벌 수 없을 정도로 상업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점포를 차리고 손님을 맞는 정주상업은 한성이나 감영 소재지의 도시에 한했다. 조선의 도시화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다. 1789년 전국 3951개 부(府)와 면(面) 가운데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는 겨우 13개이며, 그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인구의 3%를 넘지 않았다. 같은 시기 중국은 4%, 일본과 서유럽은 12%였다. 그런 이유로 가장 큰 도시 한성부에서조차 점포의 개설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상인이 행상인 것과 같은 이유로 공업자도 이동하는 행공(行工)이었다. 행공이란 말은 사전에 없지만 행상과 같은 취지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쟁기, 가래, 호미, 칼, 솥, 그릇과 같은 철기나 유기를 제작하는 야장(冶匠)은 여러 명이 패를 이뤄 이동했다. 패에는 변수(邊手)라는 우두머리가 있어서 작업을 편성, 지휘했다. 변수는 개인 집이나 마을의 초청을 받아 며칠이고 머물면서 철기를 주문 제작했다. 제시된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노변야로(路邊冶爐)’의 일부다. 길가 주막 마당에서 4명의 야장이 노를 설치해 놓고 철기를 벼리는 장면이다. 지역의 수요가 다하면 야장 무리는 노를 철거하고 다른 주막으로 이동했다.
도시의 공업도 기본적으로 행공체제였다. 왕실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내수사(內需司)라는 관청이 있었다. 내수사는 궁중에 각종 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한성의 수공업자들을 관청으로 불렀다. 내수사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문서에서 그 점을 잘 살필 수 있다. 1800년 7월 내수사는 야장 2패를 3일간, 주장(注匠) 5명을 2일간 고용해 수백 개의 돌쩌귀, 문고리, 못을 생산했다. 원료 정철(正鐵)과 연료 탄(炭)은 내수사가 제공했다. 서울에서 대장간이란 점포가 생겨난 것은 20세기의 일이다.
인적 결합
원료 철은 평안도 영변과 경상도 청도 같은 철광석 산지에서 공급됐다. 이들 지역의 철공업에 관해서는 개항기 일본인의 관찰이나 1950년대 이후 수집된 장인들의 회고를 참조할 수 있다. 청도 신원동의 유명한 철공업은 동리의 공유였다. 솥을 주조할 때마다 출자자를 모집했는데, 그때마다 구성원이 달랐다.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절하지 않았다. 용광로에 불을 붙이고 선철을 뽑아내는 작업은 며칠이고 이어졌다. 하루에 동원되는 인부는 평균 40명인데,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출자자들이 곧 인부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19세기 조선의 철공업은 산중의 용광로 작업이나 도시의 철기 제작이나 자본-임노동 관계는 아니었다. 철기, 유기, 자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업은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동출자의 계(契)로 조직됐다. 그것은 자본 결합이 아니라 인적 결합이었다.
1907년 통감부가 전국의 공장을 조사할 때 이런 형태의 전통 공업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전통 상인의 조직도 상부상조를 위한 인적 결합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 자본이 침투해 올 때 그와 경쟁할 조선의 자본 결합으로서 공장이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래 자본이 점점 지배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전통 공업과 상업은 1930년대까지 소멸했다. 1940년에 조사된 전국의 상업 점포 가운데 1887년 이전으로 설립연도가 올라가는 것은 266개에 불과한데, 대개 전통 기호(嗜好)에 기초한 한약방과 채소·과일·생선 가게에 한했다. 맹아론이 상정한 외래 자본과 전통 자본 간에 영광스럽게 치러진 전투는 실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맹아론이 여전히 큰 설득력을 과시하며 살아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추억이 아련한 그리움으로 반일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훈 < 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