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명저] "노조의 정책참여, 경제를 정치로 변질시켜"
입력
수정
지면A33
발터 오이켄 《경제정책의 원리》19세기 들어 세계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문을 걸어잠그던 ‘중상주의’에서 애덤 스미스가 제안한 ‘자유방임의 지배’로 전환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1873년 시작된 세계 최초의 ‘대불황’이 23년간 지속되자 보호주의로 회귀했고, 이는 제국주의로 이어졌다. 이후 대공황(1929년)과 세계전쟁이 덮치자 세계는 개입주의로 치달았다.
퇴조하던 자유주의를 부활시킨 주역은 자본주의 종가 영국, 미국이 아니라 독일(서독)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전쟁으로 피폐해진 독일은 1948년 화폐개혁 후 ‘질서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대처와 레이건 시대인 1980년대 초에야 ‘신자유주의’로 회귀한 영국과 미국보다 30여 년이나 빠른 행보였다.
'라인강의 기적' 이끈 질서자유주의

오이켄은 독일 경제의 ‘정신적 아버지’로 불린다. 질서자유주의의 핵심 명제는 “경제정책은 안정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시장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이켄 등장 전 독일과 유럽에선 ‘강단 사회주의자’ 구스타프 슈몰러(1838~1917)로 대표되는 ‘역사주의 경제학’이 대세였다. 역사학파는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은 존재할 수 없다’며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후진국 독일을 영국 같은 산업국가로 만들려면 자유무역론이 아니라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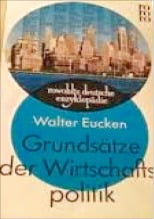
질서자유주의는 정부가 확립해야 할 ‘질서의 범위’에서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 구별된다. 애덤 스미스는 정부는 사법질서 하나만 확립하면 족하다고 했다. 그외 일체의 정부규제를 없애면 하느님이 만든 효율적 시장경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오이켄은 심각한 독점이나 특권집단의 준동에 주목하고 “사법질서뿐 아니라 경제질서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오이켄의 방점은 어디까지나 규제 최소화에 있었다. 그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정부 역할은 통화안정, 개방적 시장, 사유재산제, 계약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 등의 유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투자 분배 고용 같은 목표를 세우고 사안별로 ‘시장 과정’에 개입하는 간섭주의는 빈곤과 실업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오이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것을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자원과 재화를 언제 어떻게, 무엇에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국가’냐 ‘가계와 기업’이냐에 따라 중앙관리경제와 교환경제(시장경제)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치하 독일 경제와 혁명 이후 소련 경제를 포함한 사회주의 경제는 중앙관리경제라는 점에서 동일한 경제질서”라고 진단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 정의와 경제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짜 동인’은 끊임없는 권력욕이라고 꼬집었다. “내재적 모순 탓에 중앙관리경제는 지속되지 못하며, 거의 유일한 존재이유인 ‘평등’ 달성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의무는 '자유의 질서' 보호
《경제정책의 원리》는 부분적·사안별로 시장에 개입하는 케인스식 ‘중도 경제정책’도 작동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케인스는 투자 부족이 문제라며 적자 재정, 저금리 및 신용 확대를 처방했지만, 오이켄은 가격 동결, 환율 조작, 금리 규제 같은 미시적 규제는 ‘가격 기구’를 파괴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1960~1970년대에 세계 각국이 케인스의 총수요 확대 정책을 따르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맞닥뜨렸다는 점에서 그의 진단은 빛을 발한다.
오이켄은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간과하지 말라”며 민간 단체를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는 일의 위험도 경고했다. 기업 간 ‘동업 조합’이나 노동자 간 ‘직능 노조’ 같은 민간 단체가 끼면 경제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며 의견은 듣되 정책 결정에는 철저히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집단은 양심이 없다. 더 정확히는 어떤 경우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 책은 다양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통해 세계가 발전해왔음을 보여주는 명징한 기록으로도 읽힌다. 세계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일깨워준다. “어느 한 부분이 붕괴되면 연쇄반응에 의해 자유의 질서는 급격히 훼손된다. 국가는 항상 전체 질서의 틀로서 사고하고 행동할 의무가 있다.”
백광엽 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