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마취제 없던 시절, 수술은 공포 그 자체
입력
수정
지면A25
무서운·위대한·이상한 의학사
이재담 지음 / 사이언스북스
324·356·332쪽│각 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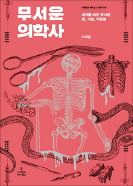
이재담 울산대 의대 교수는 동시에 출간된 《무서운 의학사》 《위대한 의학사》 《이상한 의학사》 등 시리즈 세 권에서 의학사를 관통하는 에피소드 217편을 소개한다. 저자는 “의학이 발전해 온 맥락을 살펴보면 일반인이라도 필요한 의료 정보를 얻는 힘이 생긴다”고 말한다.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무서운 의학사》에서 저자는 의료환경이 열악했던 과거를 되돌아본다. 마취제나 항생제가 없었던 18세기에는 의사로부터 수술하라는 말을 듣고 자살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생살을 째고 뼈를 끊는 아픔을 겁내서였다. 저자는 “과거에는 상상보다 끔찍하고 잔인한 치료가 잦았다”며 “현대 의학은 의료진과 수많은 환자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위대한 의학사》는 현대의학의 발전 과정을 다룬다.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진의 면면을 보여준다.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이 흘리는 피와 고름을 모아서 접종주사를 개발한 에드워드 제너, 전쟁통에도 영국 의료체계를 구축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총 한 자루 없이 전쟁터에 나가 부상병 사망률을 10% 밑으로 낮춘 무명(無名) 위생병들의 일화를 소개한다. 저자는 “숱한 시행착오에도 끝없이 도전한 의료진이 치명률을 낮추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이상한 의학사》에는 부족한 지식 수준이 빚어낸 의료 사고들이 담겨 있다. 중세시대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수은을 발라 몸을 증기로 데우다가 사망자가 속출한 사건 등이다. 현대인들이 볼 때 기괴할 수 있지만 마냥 웃을 순 없다. 지금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낭설이 곳곳에서 쏟아진다.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을 파는 업체도 있고, 한민족의 피에는 코로나19 저항물질이 흐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저자는 “낭설을 거르고 통찰력을 얻으려면 맹신보다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