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면 호구?
입력
수정
제도 폐지 후 "자진말소 해도 세제혜택" 매물 유도했지만
재건축 단지는 임대 등록 유지해야 '2년 거주의무' 면제

재건축은 자진말소 안 하는 게 유리?
15일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6·17 대책’ 발표대로 향후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조합은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이들에게만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을 주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개정안엔 예외 규정도 들어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 등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부칙의 경과조치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거주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고 1개월 안에 임대사업자가 직접 입주했다면 거주기간 2년이 모자라더라도 분양자격을 준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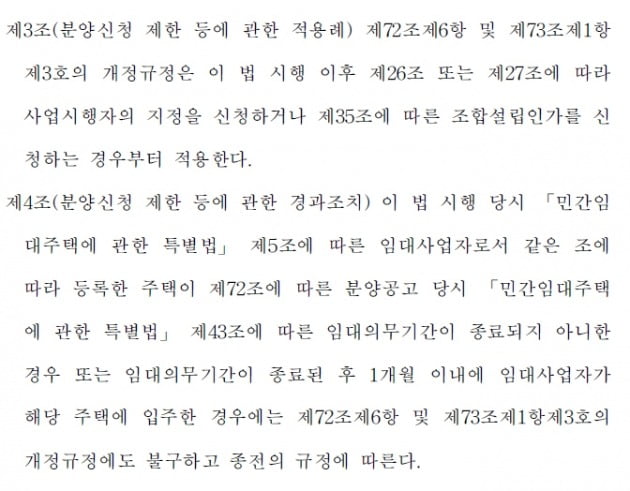
하지만 초기 단계 재건축 아파트에 세를 놓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자진말소는 자충수가 될 전망이다. 임대사업을 유지하면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될 수 있지만 당장 말소한다면 직접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의무임대기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거주 의무도 피하는 게 더 유리한 셈이다.
5~6년 내 분양신청 이뤄지면 거주의무 면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빠르면 연말 이후 설립되는 재건축조합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이후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분양신청까지 하려면 적어도 5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최근 2~3년 안에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를 개시한 임대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기간 안에 분양신청이 이뤄지면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대표적인 대상 단지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재건축사업이 17년째 지지부진한 이 단지는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연말 도정법이 개정되면 2년 거주의무 적용이 유력하다. 그런데 이 단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300명 가운데 198명은 2017년 이후 8년 임대를 시작했다. 상당수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된 2018년 ‘9·13 대책’ 이후 등록했다. 은마아파트가 적어도 2025년 연말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단계에 간다면 끝까지 임대등록을 유지한 이들은 2년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임대 개시시점의 공시가격이 이미 6억원을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임대기간 유지가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것만으로도 득을 보는 셈”이라고말했다.
제도 폐지에 따라 전국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 가운데 46만8000가구는 연말까지 자동 말소된다.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이후 갱신할 수 없는 임대주택들이다. 정부는 여기에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단지는 공시가액 기준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구체적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진말소가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지조차 예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