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위기의 시대마다 소환되는 비스마르크
입력
수정
지면A31
지금, 비스마르크
에버하르트 콜브 지음
김희상 옮김 / 메디치미디어
318쪽│1만9000원

에버하르트 콜브 쾰른대 명예교수의 《지금, 비스마르크》(메디치미디어)는 300여 쪽의 많지 않은 분량 속에서 비스마르크의 발자취와 다양한 면모를 압축해 보여준다. 역동적 변화로 점철됐던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답게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그의 ‘얼굴’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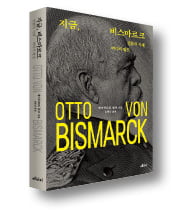
비스마르크에 대한 다면적 평가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의 장점은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 단순한 목표, 전략적 접근, 방법의 유연함, 실용주의라는 ‘현실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낭만주의와 대비되는 냉철한 현실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다소 의외지만 문학적 ‘언어’였다. 밀도 높은 생각과 날카로운 관찰을 담은, 강렬한 힘을 자랑하는 그의 촌철살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의 발언은 경외심을 일으켰고, 그의 침묵은 두려움을 자아냈다.그는 독일영방(領邦)에서 조국 프로이센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내용을 담은 프랑크푸르트제국 헌법에 대해 “프랑크푸르트의 왕관이 대단한 광채를 자랑할 수는 있지만, 광채에 진실의 힘을 실어줄 황금은 먼저 프로이센 왕관을 녹여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독일 통일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자의적으로, 주관적인 이유에서 역사의 흐름에 간섭하는 일은 언제나 설익은 과일만 따는 결과를 빚어냈다”며 “서두른다고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그의 장기가 빛을 발한 분야는 외교였다. 국가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읽어내고, 각국의 정치적 목표와 야망을 두루 꿰뚫었다. 그가 즐겨 쓰던 “전체 정세를 읽는 안목”이란 표현에서 그의 외교관이 두드러진다. 그 결과,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연달아 격파했지만 그는 승리의 우쭐함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유럽 강대국들이 유럽 한복판에 들어선 새로운 제국을 불신과 염려의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독일 창건 이후에도 살얼음판을 걷듯 프랑스의 복수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후대인은 기회를 포착해 잡아내는 능력으로 비스마르크를 기억한다. “신으로부터 받은 뜻밖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독일 통일의 기회를 낚아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독일 통일을 해냈소. 그리고 카이저 옹립도”라는 그의 짧은 소회에서 전환의 시대에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지, 왜 그가 다시 소환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비스마르크의 전기는 당대인 19세기 후반부터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영어권에선 A J P 테일러, 조너선 스타인버그의 책이 널리 읽혔고 독일에서도 로타르 갈, 오토 플란체, 폴커 울리히 등이 심도 있게 그의 인생을 다뤘다. 다만 이들 책이 분량이 너무 많거나 오래됐다는 점에서 콜브 책의 강점이 두드러진다. 저자가 1984년 《바이마르공화국》을 출간하며 높은 명성을 얻은 독일사 전문가라는 점도 신뢰를 더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