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수영장서 6세 익사…"구조요원 없어" vs "부모 책임" [법알못]
입력
수정
유족 "안전요원 없고 위험요소 사전에 안 알려"
업체 "요원 배치의무 없고 안전수칙에 써 있다"
김가헌 변호사 "아이 사망에 과실 있는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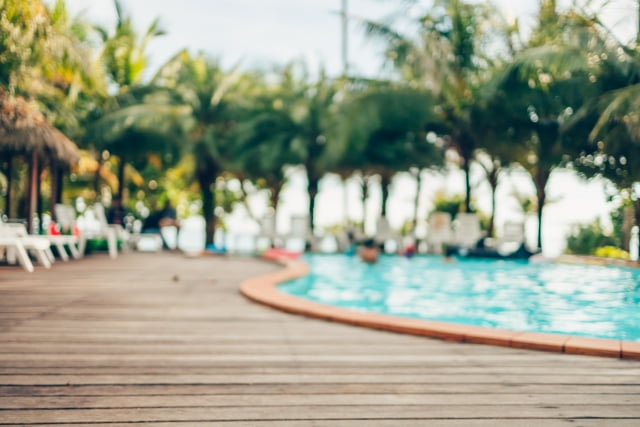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숨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 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 12일. A 씨 6세 자녀가 배수구에 팔이 끼여 뒤늦게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그는 카페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카페에 ▲수영장 내 위험 요소 존재 사실 보호자에 미고지 ▲CCTV 미설치 ▲안전요원 미배치 등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수영장 안에 그런 위험한 배수구가 있다면 카페 측이 사전에 무조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호자에게 해줘야 했는데 그런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가 전혀 없어 보호자들이 (사고에) 대비할 수 없게 했고,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감시 CCTV와 이를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없어 사고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또 "무엇보다 카페 측은 돈을 받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시설 내 아이들에 대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구조 및 구호가 현장에서 바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카페의 남자 직원 둘이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등 대화를 나눴고 가슴 압박도 일정한 속도로 하지 못해 옆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박자를 세어줄 정도였다"고 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카페 측은 A 씨의 청원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본인을 카페의 직원이라고 밝힌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먼저 A 씨가 지적한 안전요원 미배치와 관련해선 카페 수영장은 법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또 A 씨의 위험 요소 미고지 주장에 대해선 수영장에 게시된 안전수칙 사진을 공유해 반박했다. 사진에는 "노약자, 영/유아 아이들은 구명조끼 등 보호장비를 착용 후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수영장에 붙어있는 안전수칙에도 영유아와 노약자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안전요원은 부모님이라고도 쓰여 있다"며 "수영장 두 곳을 빌려 한 곳에만 아이들을 몰아놓고 다른 수영장 방갈로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계셨다"고 덧붙였다.네티즌들은 "아이 잃은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건 이해되지만 아이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책 또한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아이 잃은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직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느껴진다", "위로를 전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법률상으로는 안전요원 배치 법적 의무, 안전수칙 부착여부와 별개로 아이의 사망에 과실이 있는지 판단한다"면서 "다만, 법적 의무없고 고지의무도 다했다면, 과실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영장의 경우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배치되어 있었더라도 적시에 구조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