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공' 논란…정용진 vs 일론 머스크, 뭐가 달랐나 [박한신의 커머스톡]
입력
수정

이슈를 보는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기업 경영과 경영자의 역할 차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경영에 대한 책임'의 충돌 문제일 겁니다. 박찬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이 문제의 본질을 "개인의 표현 자유와 경영자의 책임이 마주치는 사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박 교수님(이하 존칭 생략)은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이슈가 한창이던 시기, 전화를 통해 박 교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는 우선 "우리편 듣기 싫은(혹은 불리한) 얘기라고 돌 던지고 찍어 내리면 벌거벗은 싸움만 남는다. 국가와 사회체제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영자는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개인적 의사표현이 기업에 가져올 반향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며 작은 이슈 하나로도 건수를 삼아 전쟁을 만드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영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경영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전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 정 부회장이 경영하는 이마트 앞에는 여러 사업적·정치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해당 발언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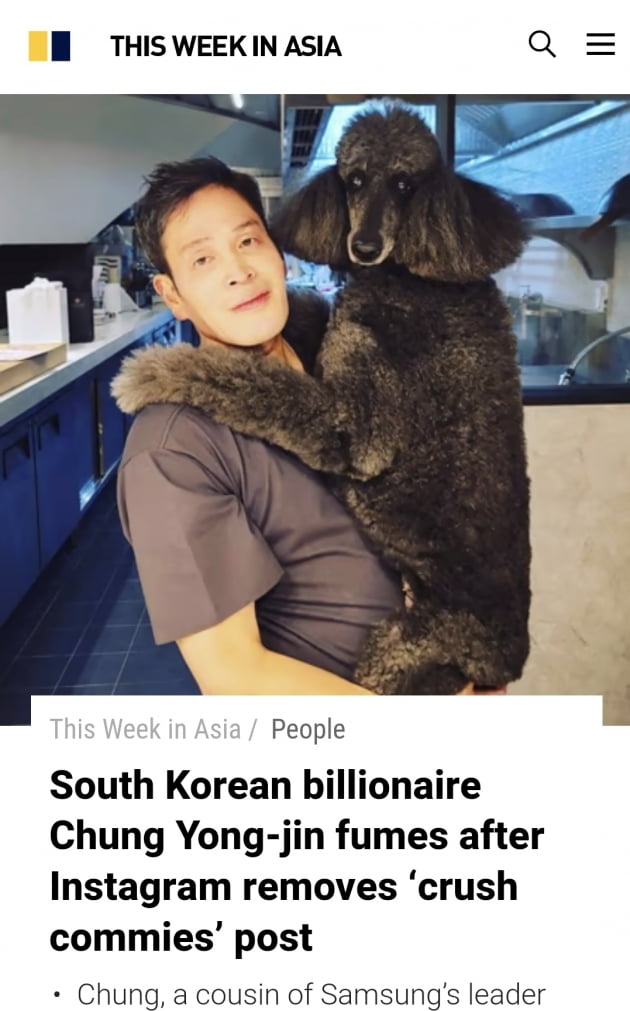
이마트 노조가 정 부회장의 발언 자제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힌 뒤 정 부회장은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후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올리지 않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슈는 사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의 SNS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의 발언권에 대해 생각해볼 많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기업가의 정치사회적 발언에 대한 금기를 깨는 모습, 은둔을 깬 친근한 사생활 노출에 적지 않은 이들이 정 부회장을 응원한 게 사실입니다. 박 교수 진단대로 일론 머스크와 같은 '힙한' 기업인의 모습을 대중들이 본 것이죠.다만 시대와 불협화음을 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우리 편이 아니면 틀렸다'는 진영논리, 기업을 얼마든지 옥죌 수 있는 정치우위의 사회, 창업과 승계 사이 한국 기업가의 현실이 정 부회장의 발언권을 억누른 것이 아닐까요. 박 교수는 "정용진 부회장의 일이 표현의 자유와 경영자의 책임,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정 부회장의 SNS 논란은 분명 각자가 의미를 곱씹어봐야할 여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