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섭의 뇌가 있는 풍경] 단맛이 자꾸 당기는 과학적 이유
입력
수정
지면A33

수렵채집 시대부터 단 것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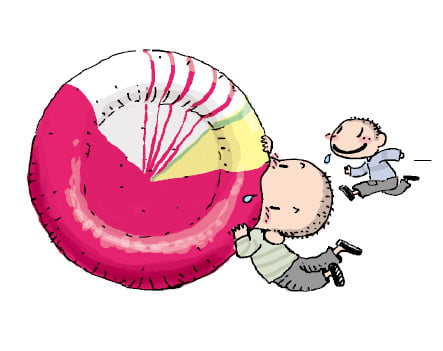
과다한 당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의 대책으로 생긴 것이 사카린,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다. 단맛은 내지만 칼로리가 없다. 이에 대한 기호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런데 동물실험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됐다. 맹물보다 인공감미료 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인공감미료 물과 설탕물 중에서는 설탕물을 선호했다. 유혹의 근원이 단맛 자체만은 아니라는 말인가? 이것이 사실임이 쥐 실험에서 밝혀졌다. 단맛은 물에 녹아있는 당 분자가 혀의 미각 세포에 있는 단맛 수용체에 결합해 일으킨 반응 신호가 미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돼 느끼게 된다. 단맛 수용체를 통해 단맛을 유도하는 물질에는 여러 당류만 아니라 아미노산, 식물유래 단백질, 합성 유기물 등이 있다. 그렇다면 단맛 수용체를 제거하면 단것에 대한 선호가 사라질까? 예상과 다르게 단맛 수용체 유전자를 제거한 쥐는 여전히 맹물보다 설탕물을 선호했고, 인공감미료 물보다 설탕물을 선호했다.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호를 할까? 물을 마시는 순간보다는 마시고 난 뒤에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선호 행동이 생성되는 것이 아닐까?
소화관에서도 당 성분 감지
실제로 당 선호 행동의 형성이 혀의 단맛 수용체와는 무관하게 소화관 내에서 별도의 수용체가 당을 감지하는 과정에 의한다는 사실이 동물실험에서 밝혀졌다. 인공감미료는 이 수용체에 붙지 않는다. 쥐에게 설탕물을 먹인 뒤에 뇌 조직을 검사해보면, 뇌간에 있는 고립핵이 활성화된다. 설탕물을 위 내에 직접 투여해도 이 핵은 활성화된다. 인공감미료 투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장에서 당을 감지하면 그 정보가 미주신경을 통해 뇌간의 고립핵에 도달한다. 소화관 내의 이 수용체를 차단하거나, 미주신경이나 고립핵의 활동을 억제하면 당 선호 행동이 형성되지 않는다. 고립핵에는 내부 감각수용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다. 위, 장뿐 아니라 간, 심장, 폐, 기관지, 구강, 비강, 인후 등에서 물리화학적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체로부터 들어오는 내부 감각정보가 이곳에 모여 처리된 뒤 적절한 뇌 부위로 전송되면 우리 몸은 최적의 반응을 하도록 조정된다. 호흡, 심장 박동, 내장 운동 등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변화하는 것이다. 초콜릿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간다.신희섭 IBS 명예연구위원·㈜에스엘바이젠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