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근의 사이언스월드] 양자물질 과학계의 '포레스트 검프'
입력
수정
지면A32

불모지 양자과학기술 개척
이제 양자과학기술은 컴퓨터, 통신, 암호, 소자, 물질,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등의 분야로 확대됐다. 조만간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양자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필자는 양자물질 연구자로서 국내외 양자물질 관련 학술행사를 주관할 정도로 양자과학의 중심에 서 있다. 양자물질 연구 행로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떠오르는데, 새로운 연구를 향한 호기심과 열정은 부지불식간에 양자과학 발전의 결정적인 순간들로 이끌었다. 필자가 양자과학기술이란 과학계의 흐름을 처음 만난 것은 1993년 프랑스 그르노블에 있는 국립연구소(CNRS)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할 때였다. 세계적인 극저온 시설 중 하나인 이곳에서 수행한 연구는 수백 mK(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보다 1000배 낮은 온도)에서 양자결맞음성(Quantum Coherence)을 자성 물질에서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자성물질에서 양자결맞음성을 연구한 최초의 결과로서 기념비적인 시도였다. 관련 연구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국제학회가 1994년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열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후원한 이 국제학회에서 Shor 알고리즘이 소개됐는데, 필자를 포함해서 이 학회에 참석한 50여 명 중 그 누구도 Shor 알고리즘 제안의 추후 파급효과까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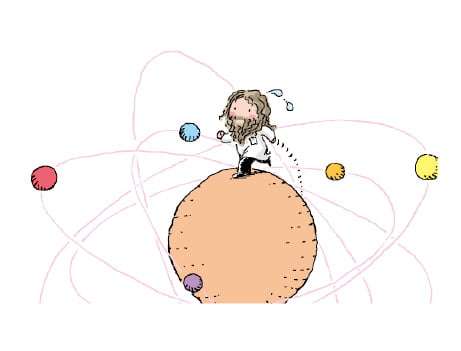
6개월이 넘는 기간에 이 연구과제를 준비하며 그렸던 큰 그림은 한국 양자물질 연구의 원동력이 됐으며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이 됐다. 역설적으로 2011년의 실패가 ‘양자물질’이라는 화두에 대해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 덕분에 2012년에는 국내 응집물질물리학자들과 함께 양자물질심포지엄이라는 행사를 준비해서 발족시킬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양자물질이라는 단일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 학회는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 양자물질 연구 원동력
양자물질은 아직도 많은 질문을 담고 있다. 근래 필자가 주관한 학술행사들은 세계 학자들이 모여 그 답을 찾아가려는 집단의 시도들이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두고 양자물질 연구의 발전과 전개라 할 것이다. 연구 열정과 호기심이 넘쳤던 30년 전의 필자는 세계 양자과학 변화와 전개의 한가운데 있었고, 거기서 받은 어떤 영감을 꽉 쥐고 노력해온 30년의 긴 세월이 현재의 필자를 양자물질 연구자로 만들었다. 이런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학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원칙과 상식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박제근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