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귀족 음악' 모차르트 vs '부르주아 음악' 베토벤…후원자들이 갈랐다
입력
수정
지면A22
이 주의 예술책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장편소설 <롤리타>의 마지막 문장은 ‘예술의 불멸성’을 뜻한다. 인간의 삶은 덧없지만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은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그 예술에 관한 책들이 연초부터 잇달아 나왔다.<정원의 기억>(오경아 지음, 궁리)은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정원을 소개한다. 그 정원은 단순히 풀밭이 아니다. 역사가 숨 쉬는 예술 작품이다. 모로코 마조렐 정원은 화려한 색상의 조합으로 유명하다. 고갱이나 고흐의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은 1980년 이곳을 사들여 별장으로 썼다. 그가 사후에 묻힌 곳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정원이 많다. 전남 담양엔 소쇄원이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빠져나오면 정원이 나타난다. 조선 중종 때 신진 개혁파인 조광조가 훈구 세력에 밀려 죽임을 당한 뒤 조광조의 제자인 양산보가 고향에 내려와 조성했다. 500년 전 이 정원을 만든 이들은 세상에 없지만 그 풍경은 그대로 남아 지금도 사람들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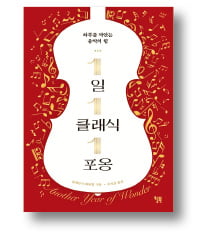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하나씩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 각각은 짧은 글이지만 무미건조하지 않다. 왜 이 곡을 추천하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1월 7일 프랑시스 플랑크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악장을 보자. 그는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 썼기 때문인지 어두운 분위기에 추동되는 것 같다가도, 그의 음악이 자주 그러하듯 내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온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은가.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