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코로나 빌미로 몰려온 전체주의 '먹구름'
입력
수정
지면A19
전체주의의 심리학
마티아스 데스멧 지음 / 김미정 옮김
원더박스 / 312쪽|1만8000원
심리학 교수가 내놓은 논쟁적 저서
"개인은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전체주의가 코로나 시기 재확산"
일부 국가들, '과학'이라는 무기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하게 억압
"팬데믹 대응 위해 불가피" 반론도

<전체주의의 심리학>을 쓴 마티아스 데스멧은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벨기에 켄트대에서 임상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책이 담고 있는 주장은 논쟁적이다. 벨기에에서 처음 책이 나왔을 때 관료들과 코로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이 억압적이라고 느낀 사람들 사이에선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 책의 번역본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독일을 거쳐 한국에도 출간됐다.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을 뜻한다.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 대표적이다. 독일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 해나 아렌트는 1951년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 정부는 독재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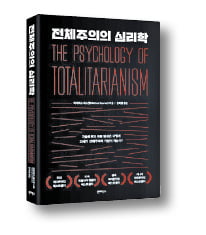
일리 있는 지적이다. 우리는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남의 의견을 수용하는가.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항상 인터넷에 정신을 연결해놓는다. 뉴스와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받아들인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는 까닭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란 매우 어렵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영향받고 있다.
책은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1784년 했던 말을 인용한다. “그러므로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 과감히 자신의 이성(오성)을 사용하라’ 이것이 계몽주의의 표어다.”그런데 저자는 갑자기 과학을 향해 공격을 퍼붓는다. 과학과 계몽주의가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도왔지만, 어느 순간 과학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이자 교리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가 드는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 사태다. 저자는 대중이 위기 속에서 TV에 나오는 전문가와 관료들의 말을 맹종했다고 지적한다.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을 하고 엉터리 통계를 들이대며 대중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한다. 안전이라는 명분에 따라 대중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희생했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저자는 이런 현실을 기술 관료가 이끄는 새로운 전체주의 출현으로 본다. 그러면서 다시 <전체주의의 기원>에 나오는 아렌트의 말을 인용한다. “전체주의는 궁극적으로 과학에 대한 일반화된 집착, 인공적 천국에 대한 신념의 논리가 확장된 형태다.”
책은 공감이 가는 주장을 담고 있지만 논리가 빈약한 부분이 많다. 시간이 흐른 뒤 코로나 방역을 비판하는 건 쉽지만, 불확실성이 높았던 당시에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저자는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봤는지 언급하지 않는다. 과학에 대한 비판 역시 균형을 잃은 듯한 부분이 보인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