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것 넘쳐나는데…세계는 왜 '식량 위기'로 고통받나 [책마을]
입력
수정
지면A18
빈곤의 가격2010년 12월 아프리카 대륙 북쪽의 지중해 연안 국가 튀니지에서 불같이 시위가 일었다.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고 굶주리는 사람이 날로 늘고 있을 때였다. 독재자인 벤 알리 대통령 가족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소식과 노점상을 하던 청년의 분신자살이 더해져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리비아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으로 반정부 시위가 번진 ‘아랍의 봄’의 시작이었다.
루퍼트 러셀 지음
윤종은 옮김 / 책세상
448쪽|2만2000원
하버드대 박사 출신 다큐 감독
2010년 식량난에 시달린 튀니지
시위 번지면서 '아랍의 봄' 시작
당시 식량 생산량 사상 최고 수준
흉작이 원인이던 佛혁명과 차이
미국 하버드대 사회학 박사 출신인 다큐멘터리 감독 루퍼트 러셀은 <빈곤의 가격>에서 이 사건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끌어내린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비교한다. 식량난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불만이 기폭제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다. 바로 식량난의 원인이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빵 가격 상승은 흉작에 따른 결과였다. 곡물 생산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른 것이다. 반면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해 아랍의 봄이 벌어지는 동안 세상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다. 실제로 당시 세계 식량 생산량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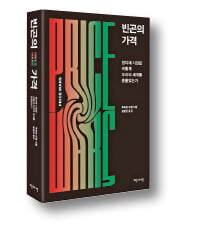
그 결과 원자재 지수에 포함된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미국산 밀, 인도산 면화, 과테말라산 커피, 러시아산 원유, 칠레산 니켈, 카타르산 천연가스 등이다.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원자재는 이런 동조 현상이 약했다.저자가 지적하는 금융화의 또 다른 부작용은 ‘가격 거품’이다. 생산이나 소비에 쓰이는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한다. 금융화한 상품은 반대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수요가 더 몰린다.
책은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상황들을 전해주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화의 함정에 빠진다.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이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높인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예컨대 세계은행은 2007~2008년 세계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바이오연료를 든다. 환경과 유가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옥수수 에탄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도 식량으로 쓰일 옥수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한 점, 유가 상승으로 농업 생산·유통 비용이 늘어난 점, 일부 국가에서의 흉작으로 세계 밀 생산량이 감소한 점 등도 책은 언급하지 않는다.저자는 투기 세력이 ‘추세 추종 전략’을 따르면서 가격 상승과 하락을 부채질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다.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저가 매수에 나서기도 한다. 1980년대 알루미늄 가격이 급락했을 때 알루미늄을 매집하며 산업 붕괴를 막은 것도 투기 세력이었다. 큰돈을 벌려고 벌인 짓이 세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책을 쓰면서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찍은 저자는 부지런히 세상을 돌아다녔다. 이라크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케냐에서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이 책에도 나온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제프리 삭스, 로버트 실러 등 유명 경제학자들도 만나 얘기를 듣는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자본주의와 금융화를 탓하는 얄팍한 주장에 그치고 말았다.
책의 부제는 ‘원자재 시장은 어떻게 우리의 세계를 흔들었는가’다. 흔들린 세상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