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들한테 대들어 찍히면서도 ‘전투기 패러다임’ 바꿔놓은 사나이 [책마을]
입력
수정
보이드
로버트 코람 지음
김진용 옮김/플래닛미디어
640쪽|2만9800원

1962년 미국 조지아 공대에서 시험을 앞두고 열역학을 공부하던 존 보이드가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는 공군 조종사였다. 한국전쟁 땐 전투기 F-86을 몰았다. 공군 학위 취득 프로그램으로 조지아 공대에서 와 있었다.
그의 공부를 도와주던 동료 학생 찰스 쿠퍼가 말했다. “그러면 비행기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엔트로피는 무효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10이라는 에너지를 계에 투입하고 그중 8만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 겁니다.”
보이드의 머릿속에 반짝임이 일었다. 에너지 보존과 손실에 관한 열역학 법칙이 공대공 전투에서 전술적 타협과 같았다. 그가 ‘에너지-기동성 이론’을 떠올린 순간이었다.
<보이드>는 존 보이드의 생애를 다룬 평전이다. 미국에선 2004년 나온 책이 최근 국내에 번역돼 나왔다. 책은 그를 F-15와 F-16의 아버지라고 평가한다. 에너지-기동성 이론을 통해 F-15와 F-16 설계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당시 미 공군의 전투기 개발은 ‘더 크고,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나는 육중한 전투기’를 만드는 데 있었다.
보이드가 민간 수학자 토머스 크리스티의 도움을 받아 방정식으로 정량화한 에너지-기동성 이론은 기동성이 우수한 경량 전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차로 치면 머슬카보다는 스포츠카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단순히 최고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단시간 안에 가속과 감속이 이뤄질 수 있어야 공중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이었다. 공군도 이를 받아들였다. F-15는 경량 전투기는 아니지만, 보이드의 의견을 반영해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당 부분 설계가 바뀌었다. 그 뒤 개발된 F-16은 보이드의 개념대로 처음부터 기동성이 뛰어난 경량 전투기로 설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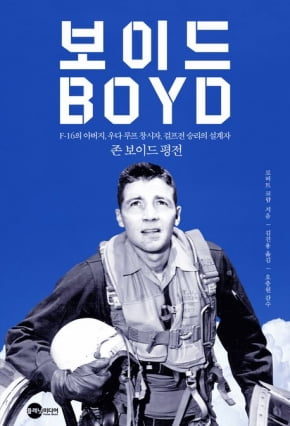
전역 후 그는 방산업체의 고연봉직을 거절하고 가난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택했다. 전쟁사, 철학, 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독학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손자병법>을 완전무결한 전쟁이론서라고 생각했다. 각기 다른 사람이 번역한 손자병법 영어번역본 7권을 밑줄을 쳐가며 읽고 또 읽었다.
빠른 의사결정 모델인 우다 루프(OODA Loop)가 그런 과정에서 탄생했다. 관찰, 방향 설정, 결정, 행동이라는 네 단계를 통해 전장과 같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다. 경제·경영, 운동 경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군사 개혁에도 앞장섰다. 광고와 달리 성능이 떨어지는 비싸고 복잡한 무기 체계들을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도입해 속 빈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기동전 개념을 반영한 미 해병대 교범을 만들었고, 육군 기동전을 채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책은 그가 걸프전 때 딕 체니 국방부 장관의 비밀 군사고문으로 있으면서 신속한 기동전 개념을 내세워, 사막의 폭풍 작전에 영향을 줬다고도 말한다.
일에만 전념해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보이드는 말년에 암에 걸려 1997년 70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적이 많았던 탓에 생전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사후에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책은 설명한다.
책은 보이드를 ‘숨겨진 영웅’으로 여겨 재조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욕심이 과했는지 그를 너무 추켜세운다는 느낌도 받게 한다. 책에 따르면 그는 F-16의 아버지이자 속 빈 군대가 된 미군을 개혁한 군사 개혁가이며, 걸프전 승리의 설계자, 미국의 손자(孫子), 20세기 최고 군사 이론가다.
보이드에 대한 책의 평가가 과장인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책에 그려진 그의 삶은 꽤 흥미롭다. 그는 ‘되느냐, 하느냐(To Be or to Do)’를 자신의 신조로 삼았다고 한다.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타협해서 출세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느냐”를 뜻하는 말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