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읽을만한’ 율리시스가 나왔다…이종일 전 교수 “번역에 20년 걸렸네요”
입력
수정
번역한 이종일 전 세종대 교수
원작 문체 살리면서도 자연스러운 우리말 살려
“율리시스, 어렵지만 코믹하고 재미있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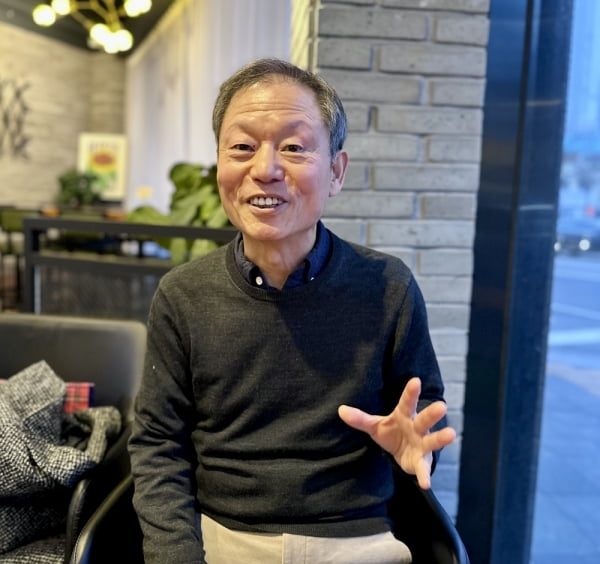
최근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제임스 조이스의 고전소설 <율리시스>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다. 한쪽 읽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 어렵기로 유명한 책이기에 “읽을만하다”는 말은 극찬에 가깝다.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벌써 입소문이 나며 초판으로 찍은 1·2권 2000질 가운데 약 1000질이 출간 한 달 만에 팔렸다. 책을 번역한 이는 이종일 전 세종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장을 지낸 조이스 전문가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1998년 가을부터 조금씩 번역을 시작한 작품”이라며 “그 후 5년 안에 책을 내기로 문학동네와 출판 계약을 맺고도 계속 늦어져 결국 출간에 12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조이스가 1922년 처음 출간한 <율리시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을 배경으로 1904년 6월 16일 하루 동안의 일을 그렸다. 특별한 사건은 없다. 아침에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38세 남성 레오폴드 블룸의 하루를 쫓을 뿐이다. 착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선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난 뒤 밤늦게 집에 돌아온다. 이 단순한 여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의식의 흐름’이다. 독자는 블룸이란 사람의 머리에 들어가 하루를 보내는 진기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동안 <율리시스>는 고(故) 김종건 고려대 명예교수의 번역본이 가장 유명했다. 하지만 문장이 딱딱하고 난해했다. 페이지마다 가득한 각주도 일반 독자의 접근을 어렵게 했다. 김성숙 씨가 번역한 동서문화사판 <율리시스>가 그나마 가독성이 높았다. 다만 의역이 많았다.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긴 문장을 짧게 나누기도 했다. 문학동네판 <율리시스>는 각주가 거의 없다. 한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번역 투가 아닌, 한국 사람이 쓴 한국 소설처럼 유려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자랑한다. 이 전 교수는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단어 대 단어(word to word)로 하나하나 직역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쉽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가 <율리시스>를 제대로 읽은 건 영국 유학하러 가서였다. 처음에는 그도 읽다가 포기했다. 재도전하면서 어려운 단계를 극복하자 점점 재미가 붙었다. 결국 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 삼을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문학 작품이 됐다.
그는 이 소설이 “코믹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의 우울한 하루를 그린 작품인데, 작가가 그런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말장난도 하면서 코믹하게, 희극적으로 풀어내죠.”
쉽게 번역했어도 <율리시스>가 쉬운 책은 아니다. 영어권 독자에게도 어려운 책이란다. 그는 “영미권에서 소위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조차 이 소설을 완독한 사람은 드물다”며 “우리가 영어권 독자가 아니라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이스는 생전에 “내가 불가해한 것과 수수께끼를 워낙 많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장차 수백 년 동안 교수들이 내가 뭘 의미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할 텐데, 이야말로 자신의 불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농담조로 말한 적이 있다. 이 전 교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원래 어려운 작품이라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