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연성과급 '퇴직자 소송' 예방하려면…
입력
수정
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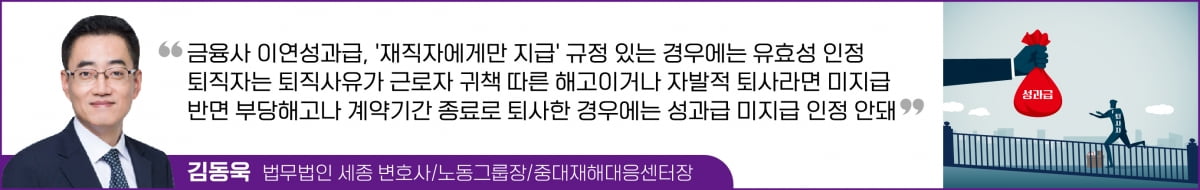
반면, 퇴직자의 이연성과급 지급청구를 인용한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합500091 판결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손익이 확정된 이후에 영업성과급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본부장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팀원이 결산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 사안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아 회사가 이연성과급을 중단해야 할 특별할 사정이 없음에도 예외인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2002 판결은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영업상,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퇴직할 경우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의 경우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의 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의 태도를 종합하면 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직요건의 유효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퇴직의 사유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의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경우라면 성과급 미지급이 유효하겠으나,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까지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다.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연성과급 지급에 재직요건을 두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퇴사자에 대해서는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재직조건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는 사안에서 퇴직자의 이연성과급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개별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여야 한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서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성과급 미지급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성과급 미지급을 규정한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게 정한 경우라도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단236132 판결 외에는 비자발적 퇴사자들에 대하여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없고, 오히려 하급심 판결의 주류는 비자발적 퇴직과 자발적 퇴직을 다르게 취급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연성과급의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나20377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4029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단101059 판결).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라도 해고의 경우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이 결정될 것이다. 기업이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고, 반대로 비위행위가 있어 정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정의 관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해고의 경우 정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는 성과급 미지급, 부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